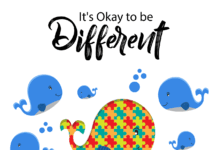그해 오월은 유난히 청명했다
그해 오월은 유난히 청명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이 결코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매일 신선한 새벽이 밤을 밀어내고 하루를 열었고 창문을 열면 풋풋한 바람이 꽃향기와 더불어 코를 거쳐 가슴속으로 들어오곤 했다.
어린이대공원 맞은편의 주택가인 구의동의 그 집으로 이사한 것이 그해 삼월이었다. 큰딸이 대공원 옆의 선화예술중학교에 들어갔고 작은딸도 바로 옆의 경복국민학교로 옮겼기에 서초동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왔다.
그때까지 살고 있었던 서초동 집이 정도 들었고 회사에서도 가까워 옮기기 싫었지만 아이들 학교가 우선이라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 교육과 집안일은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기고 있었던 나는 이번에도 그냥 아내의 말에 기꺼이 따랐다.
처음엔 내키지 않았던 이사였지만 막상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구의동 그 집은 가족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다.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편의성뿐만 아니라 집 자체가 주는 안온함과 평화로움이 모두에게 기분 좋은 아늑함을 주었었나 보다.
마당이 꽤나 크고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는 3층 양옥집이었는데 아이들 방은 3층에, 부엌과 거실은 2층에 그리고 안방과 음악실을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거실이 1층에 있었다.
물론 내가 가장 즐겨 머문 곳은 이사 오자마자 음악실로 고쳐 놓은 1층의 거실이었다. 2층 계단으로 통하는 문을 닫아 놓으면 그 음악실은 내겐 이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 훌륭한 천국이었다.
행복했던 날의 회상
1층 거실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잘 가꾸어진 화단이 있었고 화단 사이로 두세 계단 내려가면 잔디밭이 제법 널찍하게 펼쳐졌다. 잔디밭 곳곳에 라일락을 비롯한 정원수들이 제각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오래된 감나무도 한 그루 있었다.
그해 4월에 화단 가득히 피어났던 영산홍의 붉은 색깔 잔치는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할 만큼 아름다웠었다. 화초 가꾸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틈만 나면 정원에 나와 이것저것을 손보면서 즐거워했다. 강아지를 갖고 싶다는 아이들의 성화에 강아지도 한 마리 사서 기르기 시작했었다.
거실에 앉아 음악을 들으면서 강아지와 뛰노는 아이들, 그 아이들보다 더 가벼운 몸짓으로 아이들 사이를 오가며 잔잔한 미소를 보내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 이런 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기도 했었다.
우리 정원에 새들이 날아든다는 것을 안 것은 일찍 잠이 깬 어느 날 새벽이었다. 어둠이 창밖 정원 나무 사이로 아직도 여기저기 무리 지어 있는 그 새벽에 나는 나뭇가지 사이의 움직임들을 보았고 곧이어 그 움직임들이 가볍게 날아내리고 통통거리며 잔디밭 위를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새로운 발견이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충격이었다. 새들은 아마도 항시 거기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사 오기 전부터도 아니, 그 훨씬 전부터도 새들은 거기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무관심이 새들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다가 그 새벽 비로소 새들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창밖 내 정원의 새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고 또 새들은 어느덧 내 생활 속의 일부가 되었다.
그해 오월은, 구의동의 그 집으로 이사했던 그해 오월은,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했었던 내 젊은 날의 한때였나 보다.
아이들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 잘 다니고 있었고, 아내는 새로운 집에서 새록새록 커가는 아이들과 더불어 웃음소리 가득한 집안을 꾸며 나가고 있었던 그해 오월은 나도, 항시 삶을 직시하지 못하고 뒷짐 지고 물러선 자세로 허허로운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던 나도, 애써 삶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애썼었나 보다. 그렇기에 91년 오월 그때엔 이런 시도 쓸 수 있었나 보다.
오월이 되면 (91. 5. 25)
오월이 되면
내 뜨락의 하루는 작은 새들의 비상(飛翔)으로 시작된다
어디선가 각기 한입씩 새벽을 물어 나르고
쉬임 없는 날갯짓으로 어둠을 밀어내면
하늘은 위로부터 발그레한 얼굴을 들이밀고
뜨락 곳곳의 꽃도 나무도 부스스 기지개를 켠다
새들은 잠시도 쉬지 않는다
구슬이 구르듯 또르르 또르르
잔디 위를 노닐며 포옥 포옥 대지와 입맞춤하곤
꺄르르르 부끄러워 하늘로 날아올라
한바탕의 춤사위를 저희끼리 벌인다
찍 짹 찌찌 찌이째 노랫소리 자지러지고
신명 난 날갯짓 허공에 꽉 차면
내 뜨락엔 라일락꽃 내음 물큰물큰 흐드러진다
새들의 작은 몸짓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내 뜨락의 한낮은 텅 빈 공간이었다
새들의 지저귐을 알아들으며
뜨락 가득한 움직임을 나는 비로소 보았다
흔들리는 풀잎 바스락거리는 나무 잎사귀
스쳐 가는 바람
모두가 꽃 내음 그득한 삶이었다
저녁이 되면
어디론가 쉼을 찾아 떠나며 새들은
내 뜨락에 어둠을 보낸다
그들 깃털만큼이나 부드런 어둠이 사위를 가득 채우면
뜨락의 하루는 끝이 나지만
내 명상(瞑想)의 하루는 그때 다시 시작된다
새들이 한입씩 물어올 새로운 새벽을 기다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