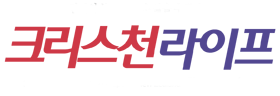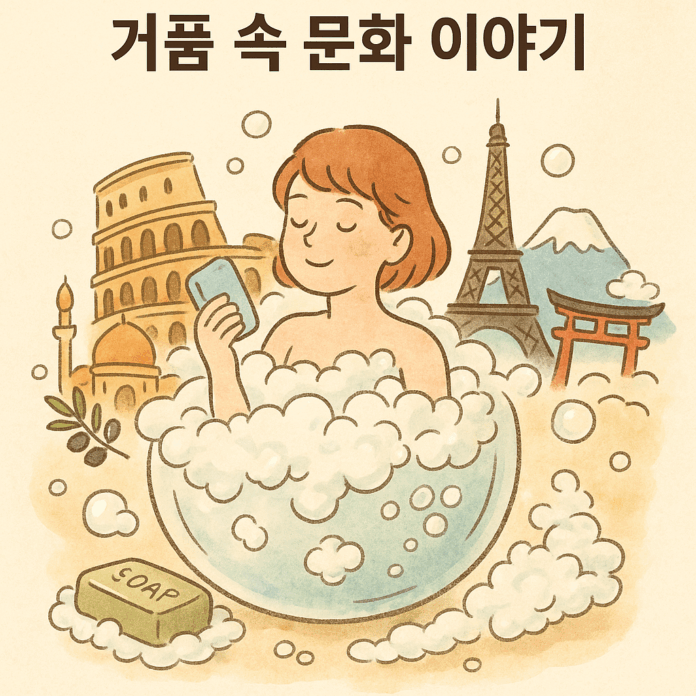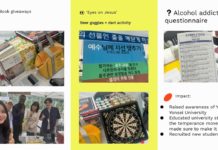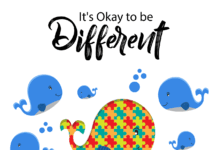“어제저녁에 쁘랭땅 공작님의 영애께서 비누로 몸을 씻으셨다는구만.”
“맙소사. 비누라니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사악한 물건을 손에 넣으신거죠? 당장 공작부인께 말씀드려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막아야 해요.”
“이미 공작께서 그 사실을 들으시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다네. 그 비누를 제작한 마녀를 반드시 찾아내 감옥에 가두라 명하셨다지.” “다행이네요. 그런 불손한 자가 영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영애께도 단단히 알려드려야겠어요. 몸은 씻을수록 병에 걸리기 쉬우니 때를 벗기는 것 같은 미련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고 찝찝하시면 향수와 파우더를 사용하시라구요. 호호호…”
지금 들으면 코미디 프로에 나올 법한 이런 대화가 패스트가 휩쓸고 간 중세 유럽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대화였다. 당시에는 피부의 모공을 통해 병이 들어온다고 믿고 있었고, 기름과 재를 섞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비누는 마녀가 만든 것으로 오해받기도 했다.
시대에 따라, 나라마다 위생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비누 사용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 이번에는 비누에 대한 그런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를 정리해 보기로 하자.
로마–비누 거품의 고향
영어로 Soap인 비누의 어원은 고대 로마의 ‘사포(Sapo) 언덕’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곳에 동물들을 태워 바치는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물들의 지방이 나무 재와 섞여 강으로 흘러들며 자연스럽게 비누가 만들어졌고, 이 강가에서 빨래하던 여인들이 이를 이용하면 빨래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 그 물질을 Soap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시리아–알레포 비누의 위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체 비누는 바로 시리아의 ‘알레포(Aleppo)’에서 생산되는 비누이다. 2024년 UNESCO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한 이 비누는 올리브유와 월계수 오일 등 천연재료만으로 만들어지는 고급 비누로 6개월 이상 숙성을 거치면 겉은 황금빛, 내부는 짙은 녹색이 되어 녹색 금(Green Gold)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비누는 인륜지대사인 결혼의 지참금이나 결혼 선물로 주어지기도 했을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았었다. 안타깝게도 시리아의 내전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붕괴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한다.
터키–올리브 비누 거품 마사지
한국과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터키에는 우리와 같은 공중목욕탕이 있고, 이를 하맘(Hamam)이라고 부른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때를 미는 문화가 있는데 방식은 우리와 유사하다. 때를 민 후에는 올리브 계열의 비누를 천으로 비벼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 내는데 전신에 그 거품을 얹은 채 마사지를 받게 된다. 이슬람교에서는 청결이 믿음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하맘은 이들에게 단순히 목욕만이 아니라 신앙의 실천과 정신적 정화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에 사용되는 비누 또한 순전하고 양질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의외의 목적을 가진 비누향
비누하면 떠오르는 프랑스의 마르세유 비누(Savon de Marseille).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 비누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프랑스 왕 루이 14세는 이 비누의 공식 규격과 성분 비율까지 법령으로 규정했다. 동물성 기름을 쓰지 않고 올리브유만 사용하여 제조하게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루이 14세 본인은 목욕을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해 평생 딱 두 번만 했다는 루머가 전해져 내려온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루이 14세가 있었던 베르사이유 궁전에는 특이하게도 화장실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석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실례를 범해 그 악취를 가리기 위해 향수 제조가 발전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그래서 아마도 비누도 그런 용도에 쓰이기 위해 향이 센 제품을 선호하는 문화가 발전된 듯하다.
중국–허브와 전통의 조화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비누 대신 허브물이나 쌀뜨물로 몸을 씻었으며, 한방재료나 허브를 넣어 약용기능을 강화한 세정제가 사용되기도 했다. 근대에 들어와 서양을 통해 ‘비누’라는 개념이 보급되면서, ‘肥皂(페이자오)’라는 단어가 생겼다. 많은 중국인은 황련, 감초, 녹두 등… 한약 냄새 폴폴 나는 ‘약용 비누’에 익숙하며,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라는 다섯 가지 원소를 바탕으로 우주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오행 이론에 따라 녹차비누, 홍화비누, 황토비누, 흑임자 비누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비누가 사용되고 있다.
일본–비누향으로 전하는 예절
일본에서는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를 오모테나시(おもてなし)라고 하는데, 이는 타인에게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미있는 경험을 선사하려는 헌신이며,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고객의 요구를 예의 바르고 세심하게 예측하여 충족시켜 드리고자 하는 진심 어린 열망을 담고 있다고 한다. 전통 여관(료칸)이나 식당 등에서 고객 서비스의 원칙으로 지켜지고 있는데 손님이 오기 전에 향기로운 세제로 손님이 사용할 물품들을 세탁하고,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등 청결한 첫인상을 주는 것이 오모테나시 환대의 기본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물에 뜨는 비누
미국의 한 비누 회사에서 비누를 만들다가 실수로 반죽을 너무 많이 섞어 물에 둥둥 뜨는 가벼운 비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회사는 이를 불량품으로 치부하지 않고 오히려 물에 뜨는 점을 부각시켜 홍보했는데, 당시 목욕하다 비누를 물에 빠뜨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던 소비자들은 이 비누에 열광했고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 비누의 이름은 IVORY로 시편 45편 8절,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 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에서 언급된 상아(IVORY)를 제품명으로 정했다고 한다.
한국–추억의 세숫비누
뭐든지 귀했던 나의 어린 시절 기억에는 세숫대야 옆에 노란색 다이알(Dial) 비누가 놓여 있었고, 이 비누 한 장으로 얼굴, 몸, 머리, 심지어 빨래까지 다 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 생각하면 피부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지만 그 시절엔 비누 하나면 모든 세정은 만사 OK였다.
이스라엘–하나님을 향한 정결의 열망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누와 비슷한 세정제를 사용했으며 이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예레미야 2:22)
여기서 ‘잿물’과 ‘비누’는 원어로 ‘보레트’(borīth: 알칼리성 잿물), ‘네테르’(neter: 천연 탄산소다(sodium carbonate)를 의미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세정은 단지 위생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거룩함을 상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비누는 단지 몸을 씻는 도구가 아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예절이 되고, 예술이 되며,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과 정성의 표현이 된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작은 거품 속에 수천 년을 이어온 인류의 청결에 대한 열망과 문화적 취향, 신앙심의 표현이 담겨 있으니 재미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