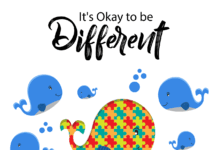비 내리고 바람 부는 저녁
이번 주 들어 부쩍 비 오는 날이 많았다. 며칠 째 계속 비 내리고 바람 부는 날이 계속되더니 어제 저녁엔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며 바람의 속도도 더욱 빨라져 사뭇 불안한 느낌마저 들었다.
라디오 뉴스에서 혹시 있을 정전 사태에 대비해 손전등을 가까이 놓아두라는 경고까지 듣자 더욱 불안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소식에 마음 한구석이 뒤숭숭한 요즈음에 드디어 이 평화로운 뉴질랜드에도 좋지 않은 변화가 다가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저녁 내내 머릿속을 오락가락했다.
밤이 깊어지며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그 빗방울을 몰고 오는 바람 소리는 더욱 점점 커져만 갔다. 빗소리와 바람 소리가 합해져 때로는 누군가가 내뱉는 신음처럼 귀에 거슬렸다. 듣고 있던 음악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평화로워야 할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가 불협화음으로 삐걱거리는 소리로 들렸다. 나는 일어나서 음악을 끄고 책상으로 돌아왔다. 보고 있던 책을 계속해서 읽으려고 했지만 책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귀는 빗소리 바람 소리로 윙윙거렸고 눈은 자꾸 창밖의 어둠을 향했다.
그때 마침 “춥지 않으세요?”하며 아내가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고 들어왔다. “그냥 따뜻한 물에요. 이런 날씨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하면서 내게 따뜻한 잔을 권하는 아내의 모습엔 날씨로 인한 불안의 기미는 전혀 없었다.
잔을 받아서 손에 쥐니 따뜻한 기운이 잔을 통해 손으로, 손을 통해 가슴으로 전해졌다. 잔을 입으로 가져가 아내의 배려만큼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나는 그때까지 공연히 불안해했던 마음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11시가 넘어 자리에 들었다.
해가 조금만 나와도
“그만 일어나세요.”하는 아내의 목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누운 채로 창밖을 올려보았다. 다행히 비도 바람도 그친 것 같았고 창밖이 제법 훤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 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흐렸지만 낮은 구름 뒤로 해가 살며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간밤에 얼마나 바람이 불었는지 마당엔 나무에서 떨어진 잔가지와 하얗게 떨어진 장미 꽃잎이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었다. 어젯밤에 비하면 무척이나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해가 조금만 나와도 이렇게 다르구나.”하고 나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뭐라고 하셨어요?” 침대를 정리하던 아내가 나의 혼잣말을 들었던지 내게 물었다. “아니, 그냥……” 하고 얼버무리다 나는 “우리 오늘 아침은 나가서 먹읍시다.”라고 아내에게 말했다. 며칠 만에 모처럼 비가 그친 이런 날에는 밖에서 아침을 먹고 바닷가를 거닐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이다. “와, 좋아요.”하고 아내도 활짝 웃었다.
우리는 빨리 준비를 하고 나와 데본포트(Devonport) 바닷가에 우리가 잘 가는 카페로 차를 몰았다. 카페는 아침 손님으로 북적거렸지만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우리는 모처럼 남이 차려주는 아침을 맛있게 먹었다.
지난 8월에 내려진 록다운(lockdown)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밖에서 먹어보는 아침이었다. 카페에 온 손님 중 낯익은 얼굴이 한둘 보였다. 아직도 록다운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록다운의 수위가 조금 낮아져 조심스럽게라도 식당 출입이 가능해지자 그 작은 행복을 즐기는 사람들의 얼굴이 오히려 전보다 환해 보였다. 나는 다시 속으로 생각했다. ‘자유가 조금만 주어져도 이렇게 다르구나!’
바닷가 산책 길에 만난 장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서 나온 뒤 우리는 차를 바닷가로 몰았다. 데본포트 선착장 앞의 잘 가꾸어진 꽃밭을 보며 한 바퀴 돈 뒤에 도서관을 끼고 킹 에드워드 퍼레이드(King Edward parade)를 따라 아주 서서히 차를 몰았다.
어젯밤 비바람을 견뎌낸 길은 이 아침 오히려 말끔한 표정으로 우리를 받아주었고 아직도 해가 온전히 나오지 않아 흐린 하늘 아래 바다는 옅은 회색의 물결을 점잖게 출렁이며 우리에게 아는 체를 했다. “어디를 좀 걸을까?”하고 바닷가를 걷는 것을 좋아하는 아내에게 물었다.
우리가 사는 데본포트에는 아름다운 바닷가가 다섯 개나 있기에 우리는 그날 기분에 따라 골라 걷곤 했었다. “글쎄요, 다 좋지만 거기 첼텐햄 비치(Chelttenham Beach) 어때요. 아담해서 오늘 같은 날 좋을 것 같아요.”라고 답하는 아내의 말에 나는 오른쪽 해군 박물관을 지나 왼쪽으로 차를 몰았다. 마침 다음 날에 문학회 모임을 첼텐햄 바닷가의 뷔페식당에서 갖기로 했기에 나도 미리 가보고 싶었던 곳이다.
이심전심이란 말이 이럴 때를 위해 생겨난 말일 것이다. 차가 첼텐햄 길에 접어들어 바다가 가까워졌을 때다. “어머. 저기 좀 보세요, 정말 장관이네요.”하고 아내가 앞을 가리켰다. 나도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다. 간밤 폭풍우로 깨끗이 닦여진 길 위엔 꽃눈이 내려 있었다. 붉은 꽃눈이었다. 길 따라 뉴질랜드의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포후투카와가 나무마다 마음껏 꽃을 피워내고 있었는데 이곳 첼텐햄 바닷가의 포후투카와는 밤새 모진 폭풍우를 몸으로 막아내며 그 분투의 흔적을 땅 위에 꽃눈으로 남긴 것이었다.
마오리(뉴질랜드 원주민)의 전설에 의하면 젊은 전사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하늘로 오르다 떨어져 포후투카와 나무가 되었고 떨어져 내리는 꽃잎은 그의 피를 상징한다고 했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꽃잎은 붉은색 꽃눈이었다.
겨울에 크리스마스를 맞는 북반구 나라들과 달리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맞아야 하는 이곳 뉴질랜드에는 흰 눈이 소복이 내린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있기에 어젯밤엔 비가 충분히 내려 길을 깨끗이 씻어냈고 바람은 포후투카와 나무를 흔들어 꽃잎을 떨궈 붉은 눈처럼 길을 덮었나 보다.
레드 크리스마스(Red Christmas)
“레드 크리스마스(Red Christmas)네요. 여기서 오래 살았어도 이런 광경은 처음에요. 굉장히 예뻐요.”하고 아내가 내 속마음을 읽은 것처럼 차창을 통해 들어오는 풍경을 보고 말했다. 나는 꽃눈을 밟지 않도록 차를 멀찌감치 세우고 아내와 같이 밖으로 나갔다. 보통 때엔 차를 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곳 첼텐햄 바닷가에 오늘 아침엔 사람도 없었고 차도 없었다. 마치 우리 부부를 위해 이 아름다운 풍경을 밤새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듯한 느낌이었다.
길을 덮고 있는 붉은 꽃눈과 포후투카와 나무 뒤편으로 내일 모임이 있을 뷔페식당도 보였다. 그 뒤론 아직도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기는 수줍다는 듯한 해를 감싸주고 있는 구름 아래 은회색 바다가 잔잔히 너울거리고 있었다.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평화로운 정경이었다.
나는 문득 어젯밤 비바람 부는 날씨를 투정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나이가 칠십이 넘도록 살아왔어도 아직도 궂은 날 뒤에 갠 날이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내가 부끄러웠다. 비바람 소란스러웠던 밤이 없었다면 오늘 아침 눈뜨고 맞는 창밖이 그렇게 환할 수 있었을까? 해가 조금만 나와도 세상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을까? 록다운 뒤 처음 먹은 카페에서의 아침 식사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 비 오고 바람 불지 않았다면 이 아침 첼텐햄 바닷가의 레드 크리스마스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
공연한 투정이나 하고 나는 곤히 꿈나라를 헤매고 있을 때 어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손길은 비를 이용해 깨끗이 길을 닦고 바람을 이용해 포후투카와 붉은 꽃잎을 땅 위에 뿌려 ‘레드 크리스마스’를 준비해 주신 것이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한 깊은 배려이셨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나는 중얼거렸다. “또 뭐라고 혼잣말을 하세요? 오늘 좀 이상하세요.” 옆에 있던 아내가 나를 보고 말했다. “흰 눈은 아니지만 이 붉은 꽃눈 위를 걷고 싶어요. 눈보다 부드러울 것 같아서요.”하더니 아내는 발걸음도 가볍게 레드 크리스마스의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소녀 같은 아내의 행동에 나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 사진으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