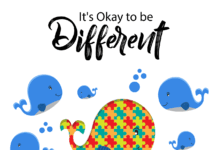사람을 만나기 싫을 때가 있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한동안 사람을 만나기가 싫을 때가 있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렇지만 사십 고개를 갓 넘었던 그 가을 한철 동안은 사람을 만나는 게 도무지 반갑지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도 그 만남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누구를 만나든 만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이미 마음은 딴 데 가 있었고 어떻게 든 빨리 헤어질 궁리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일쑤였다. 만나면 주고받아야 하는 일상의 대화가 너무도 지루했고 자꾸만 굳어지려는 내 얼굴 표정을 애써 관리해야만 하는 스스로가 짜증스러웠다.
기껏 큰마음 먹고 약속을 정해 누군가를 만나면 몇 마디 인사를 나눈 뒤 내 시선은 이미 딴 곳을 두리번거리고 있었고 마음속에선 벌써, ‘시간 낭비야 이 시간에 음악을 듣든지 아니면 책을 읽는 게 낫지’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만나는 상대가 누구든지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대인기피증이 내게 왔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단지 사람과의 만남이 기대했던 것만큼 내 마음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고 그런 경우가 너무 자주 생기다 보니 차츰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졌던 것 같았다.
그 결과로 어느덧 나는 나만의 작은 성(城)을 쌓아가고 있었고 아무에게도 그 성의 문을 열어주려 하지 않았다. 물론 나 자신도 그 성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연생활이 단조로워지고 일상의 반경은 회사와 집 사이로 좁혀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사무실 창으로 늦가을 햇살이 아른거리며 넘나들었고 그때 “왜 요새는 친구분들도 안 만나세요?”하고 그날 아침 무언가 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조심스레 묻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불현듯 전화기를 들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당신 집에 있을 거지? 나 오늘 좀 일찍 들어갈 게.”라고 말하고 나는 회사를 나왔다.
서초동 사무실에서 청계산 자락에 있는 신원동의 집까지는 차로 십여 분 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지만 급할 것이 없는 그 가을 오후의 이른 귀갓길은 왠지 마음이 가벼워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낯익은 거리 풍경이 새삼 정겨웠다.
아내가 사 놓은 항아리
“어서 오세요. 피곤하신가 봐요?” 대문을 열어주며 묻는 아내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정원 한구석에 놓인 벤치 위에 주저앉았다. 늦가을 오후의 하늘은 온통 푸르름이었고 늦은 오후 햇살이 마당 구석구석을 밝혀주고 있었다.
“여기 참 좋네. 당신도 좀 앉아요,”라고 내가 말하자 금세 표정이 밝아진 아내가 “차 끓여 갖고 나올 게요,”하고 팔랑 날듯이 가벼운 걸음걸이로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벤치 안으로 좀 더 몸을 밀어 넣으며 편하게 앉았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감나무 잎사귀들은 이미 다홍빛으로 물들었고 잔디도 노랗게 퇴색하고 있었다.
‘벌써 가을이 깊었구나’라고 혼자 중얼거리는데 벤치 앞 탁자 위에 놓여있는 항아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거 못 보던 거네”라고 나는 차를 갖고 나온 아내에게 물었다. “아, 오늘 아침에 샀어요. 항아리 장사가 골목을 돌아다니길래 나가봤다가 하나 샀어요. 예쁘죠?”라고 묻는 아내에게 나는 건성으로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유심히 항아리를 보았다.
늦가을 정원에서 참 오랜만에 아내와 더불어 차를 마시며 이것저것 노래하듯 이야깃주머니를 풀어놓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인 그 오후는 그 가을 한철 굳게 쌓아가던 내 작은 성(城)도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시간이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내내 아내가 사다 놓은 그 작은 항아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작은 몸뚱어리에 뻥 뚫린 둥근 입 속으로는 푸른 가을 하늘이 쏟아져 들어가는 것 같았고 가끔씩 산들거리는 가을바람도, 그리고 너울거리며 서성이는 저녁 햇살마저도 그냥 지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반갑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람들과의 만남이 반갑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의 마음 자세에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 오후 작은 항아리로부터 배웠다. 그 저녁 자기 전에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항아리
너의 모습이 어떤 것이든지
너의 색깔이 어떤 것이든지
내 너를 사랑함은
항시
하늘을 향해 몸의 일부를 열어 놓은 너의 자세에 있다
동그스름한 너의 몸
안으로 안으로
깊은 설움과 고뇌를 내리 쌓고
모으다 모으다
동그라미가 된 두 손으로 몸을 열고
곡선의 몸가짐 가장 겸손한 앉음새로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너의 자세
항아리여
너
항시
열려있는 축복의 몸짓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