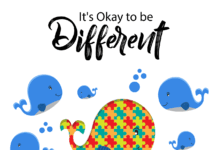포트럭(potluck)이란 영어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행운의 항아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맥락의 우리말로는 ’복단지‘ 혹은 ’꿀단지‘ 정도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Oxford 영어사전에는 ’whatever(hospitality etc.) is available’이라고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 포트럭 문화가 생활화된 나라이다. 각종 모임이나 파티 행사에서 뿐 아니라, 점심(potluck lunch)이나 저녁 식사(potluck dinner)를 겸한 초대에서도 한 접시씩 들고 와서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거창한 요리 솜씨가 아닐지라도 평소 즐겨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서로 소개하며 정담을 나누는 포드럭 문화는 영어사전의 설명처럼 환대의 가장 소박하고 아름다운 표현일지도 모른다.
이 포트럭 문화는 이민의 삶에 큰 도움을 주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더 나아가 이민은 포트럭 인생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닌 듯싶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본다. 이민 초기에는 키위 가정에 초대를 받아 가서 그들의 소박하고 검소한 식탁을 보고 놀랄 때도 있었고, 이렇게도 손님을 초대하는구나 하며 의아해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음식을 한 접시씩 준비해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질 수 있었던 경험을 많은 이민가정이 갖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 말은 포트럭 문화에 적응할수록 이민생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지구촌 어디에서나 한국음식은 대단한 인기를 끄는 시대가 되었다. 뉴질랜드에서도 각 지역에서 각종 행사가 열릴 때 마다 한국음식은 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행사에 참여해서 현지인들에게 한국음식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것도 훌륭한 포트럭 정신의 실천이다. 포트럭의 경험들을 통해서 서로가 타 문화를 쉽게 접하며 이해 할 수 있게 되고, 이민자들은 낯선 이국땅에서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달래기도 하며, 정착을 위한 좋은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오랜 사회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경제적 넉넉함을 갖고 이민을 나왔다 할지라도 이웃과 높은 담을 쌓고 혼자서 여유로움만을 즐기고 산다면 진정한 이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다. 이민은 누구에게나 개척의 삶이다. 이민의 애환을 경험하고 정착을 위한 몸부림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며, 이웃을 알고 그 사회를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포드럭에 적극 참여하기를 권하고 싶다. 이민의 삶에서 참여 정신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용기가 부족하고 앞서서 뭔가를 아직은 할 수 없을지라도, 나의 영어표현이 아직 부끄러울 수 있어도,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도 기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다.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 부부는 한국의 접대문화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다. 물론 한국에서도 포트럭 문화가 대중화되고 있다고 본다. 포트럭은 일찍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말씀하시던 십시일반의 정신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된 현대사회에서 일상의 모습들은 진정한 포트럭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뿐이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나 지인을 집으로 초대하기보다는 외식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어쩌면 참 쉬운 방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단순히 ‘식사 한번 하자’라는 인사가 깊은 정감보다는 환대가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형식으로 느껴지면서 자꾸만 뉴질랜드의 포트럭 풍습이 생각나곤 하는 것이 사실이다.
비용을 여러 사람이 함께 분담한다는 말로 쓰이는 더치페이(dutch pay)라는 말이 있다. 주로 식사비용을 각자가 계산하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오늘날 식당에서 이런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어느덧 재빠른 통 큰 사람이 계산대 앞에 서게 된다. 누군가 더치페이란 말을 꺼내고 싶어도 인색하다는 딱지가 씌워질 테니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포트럭 정신은 음식문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차츰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게러지 세일(garage sale)도 이런 절약과 상생의 정신에서 온 것이라고 믿는다. 나에게는 필요치 않은 물건이 남에게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 출발을 시작하는 이민자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
뉴질랜드의 첫 경험이 토요일마다 게러지 세일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필요한 것들을 사는 작은 즐거움이었음을 필자는 잊지 못한다. 그때 5불에 샀던 작은 의자 하나를 20년 넘도록 요긴하게 사용했던 기억에 지금도 미소를 머금는다.
우리 가족이 뉴질랜드에 처음 도착해서 지겨운 모텔 생활을 끝내고 웰링턴의 한 동네에 겨우 셋집을 얻었지만 아무 살림살이도 없이 불안해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어느 날 외출 후에 돌아와 보니 집 뜰의 잔디가 말끔히 깎여 있었다. 아무 지인도 없는데 누가 이런 친절을 베풀었을까 궁금해 하며 몇 주가 지난 후 밖에서 갑자기 잔디를 깎는 기계음 소리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가 보니 바로 옆집의 할아버지였다. 잔디 다듬을 기계도 없는 것을 아시고 아무런 말씀도 없이 도와주신 것이다.
그 이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단순한 한국음식을 맛보게 하는 것뿐이었음을 기억한다. 우리가 그곳을 떠날 때까지 잔디를 깎아주신 구세군의 은퇴 사관 할아버지를 우리는 잊지 못한다.
필자가 키위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했을 당시 팀 목회를 위한 우선 과제는 한 교회 내 키위 회중과 한인 회중의 두 이질적인 교인들을 어떻게 화합과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키위 담임 목회자와 함께 결정한 첫 시도는 환대 주일(hospitality Sunday)을 지정하여 키위 성도와 한인 성도 가정을 연결해서 서로 방문하고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였다.
가족을 소개하고 음식도 함께 나누는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자매가정을 이루고 신앙과 이민생활의 적응을 빠르게 도와주던 포트럭 정신에서 온 것임을 기억한다.
포트럭 정신은 나의 정체성을 상대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나도 상대를 알고 이해함으로써 소통하는 중요한 인간관계를 제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포트럭 문화가 이민자들의 삶에 기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신앙인의 삶의 방식도 이런 포트럭 정신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선교현장에서, 구도자를 향한 전도의 현장에서 크리스천의 포트럭 정신은 발휘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많은 포트럭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한 아이가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 바구니에 찼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포트럭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었다. 보잘것없고 소박하지만 내 마음이 담긴 접시 하나가 내 이웃의 마음을 달래고, 지치고 외로운 당신께 소망을 갖게 하는 포트럭 정신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성큼 다가선 이때, 여러분 모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