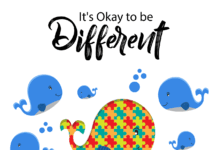이민의 무게를 언어의 무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민이라는 삶 속에 영어는 단지 비자를 받기 위한 점수 만들기를 넘어서는 더 큰 의미가 있다. IELTS를 공부하고 원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과정 속에 분명히 영어가 향상되지만, 그 점수가 끝은 아니다.
이 글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까? 혹은 영어를 정복할까?’라는 방법이나 해답에 대한 글이 아니다. 도리어 영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며, 그 부족함 속에서 영어가 금방 늘지 않음에도 영어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민의 무게를 그리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를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표현하려는 글이다.
초기 이민자에게 정보는 곧 시간과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귀한 보물과 같다. 특별히 영어가 유창한 사람은 1차 정보를 바로 열람하고 숙지하고 적용할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영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1차 정보를 번역한 2차 정보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정착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혹은 뉴질랜드에 오래 거주한 지인 찬스를 사용해야 한다.
1차에서 2차로 번역이 이루어지는 과정 동안 누군가가 경험한 과거의 사건과 이야기들이 이민 사회에 공유되면서 ‘누가 뭐라 하더라’라는 ‘하더라, 카더라’ 통신이 퍼지는데, 그 경험과 사건은 그 때와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는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서 법이 바뀜으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정보가 된다.
영어를 잘해도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데, 영어가 잘 안되면 그만큼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노출될 위험이 많아지기에 이민이라는 삶에 들어선 이상 영어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필수’임을 기억해야 한다.
영주권 이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벗어나 다른 선로로 갈아타려는 첫 번째 관문도 결국은 영어다. 하지만 이민을 와서 한 번도 영어를 하지 않다가 다시 영어를 해야 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변화는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는 결단과 맞먹는 더 큰 결단과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누릴 수 있을 뿐이다.
영어를 해야 할 필요와 이유는 확실하지만 영어를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편안한 안전지대가 너무 달콤하기에 선뜻 그 동안 내가 데워 놓은 뜨끈한 방석을 박차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그곳에 머무르다 보면 시간은 금방 흐르고 ‘그때 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만이 남을 뿐이다.
뉴질랜드에서 자라는 자녀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영어는 필요하다. 자녀의 영어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부모가 해줄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실제로 학부모 상담 시 뉴질랜드 학교에서는 부모의 잘못된 콩글리시로 아이의 영어 발달에 방해를 주지 말고 차라리 한국어를 잘 가르치라고 신신당부를 한다. 한국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한글만 잘 가르쳤다고 해서 이민자 부모의 소임을 다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아이의 영어를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영어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마냥 영어를 금방금방 습득하는 아이의 모습을 좋아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언어의 습득은 문화의 습득을 의미하며, 그 문화 속에서 정체성이 확립되기에 아무리 한글을 한국에 있는 아이들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엄밀히 말해 이민자의 자녀들은 한국인은 아니다.
아이들이 뉴질랜드 안에서 뉴질랜드화 되는 과정 속에 부모가 영어를 전혀 하지 않고, 뉴질랜드의 문화를 배우지 않고, 전혀 뉴질랜드의 한 부분으로 더불어 살지 않는다면 부모와 자식간에 오해가 생길 수 밖에 없고, 어느 정도 독립할 시기가 되면 영영 소통할 기회를 잃어버릴 위험도 있다.
따라서 부모는 그저 영어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자녀와 똑같은 수준은 될 수 없지만 자녀와 함께 걸어가려는 최소한의 노력으로서 영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집집마다 사정이 있고 환경이 다르겠지만 특별히 이민 생활 속에서 건강한 부부생활을 위해서도 영어 공부는 필요하다.
보통 영주권을 받는 과정 속에 주 신청자의 영어 실력이 주 신청자의 배우자보다 좋은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둘 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영어를 못 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의존하게 된다.
이런 의존이 계속 되다 보면 한 사람은 계속 영어가 향상될 수밖에 없고, 다른 한 사람은 도태되고 정체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혹시라도 먼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기라도 하면 남은 배우자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민을 온 이상 영어는 시험이 아닌 삶이기에 부부간의 영어 실력의 불균형은 결국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부부간의 역할분담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처음 뉴질랜드에 와서 누가 전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툰 경험이 있다. 아내는 내가 더 영어를 잘하니 내가 해야 한다는 논리였고, 나는 영어를 더 늘리려면 노출되어야 하니 아내보고 직접 해보라는 논리였다.
전화를 하면 식은땀이 나고, 울렁증이 다시 시작되고, 못 알아들었을 때“Pardon”이라는 한 마디를 할 때 자존심이 상한다.
하지만 그렇게 전화를 반복하고 직접 부딪혀보니, 물값은 왜 이리 많이 나왔는지, 인터넷 약정 플랜 중 더 좋은 플랜이나 혜택은 받을 수 없는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등등의 일상의 삶을 서로 무리 없이, 물론 아직도 “Could you please speak slowly? I can’t fully understand what you mean”를 연발하지만, 둘 다 서로를 의지는 하되 의존하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있다.
뉴질랜드에 살아도 이민 연수가 10년, 20년이 되어도 정말 영어가 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정말 빠르게 향상된다. 그저 공부는 때가 있다고 혹은 뇌가 굳어버렸기에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필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할 수 있다. 문제는 사용해야 한다. 읽고 쓰고 말하고 들어야 한다.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나서 영어의 귀가 뚫리고 혀가 꼬이면서 영어가 술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고 영어 신문을 읽고 영어 방송을 듣고 영어를 사용할 환경과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언젠가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주저하지 않고 말하고, 들어야 할 것들을 잘 들을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을까?
영어로 고민하는 모든 분 들에게 화이팅을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