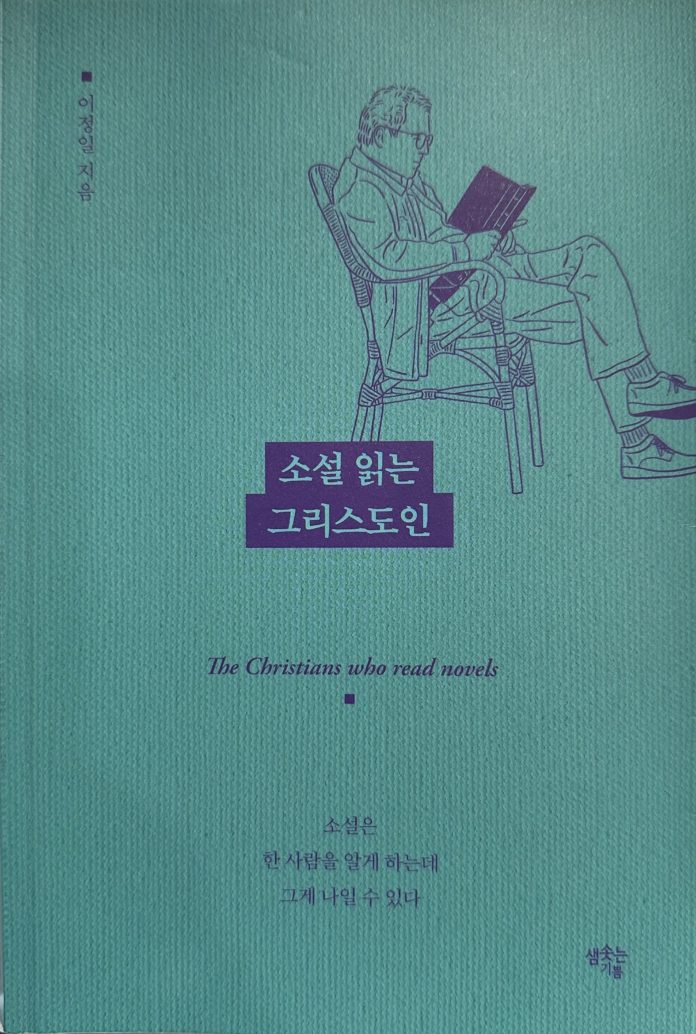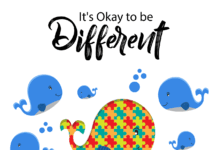성경 읽을 시간도 부족한데 소설을 읽으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설 읽는 그리스도인』의 저자 이정일 목사는 그리스도인이 소설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소설이 왜 필요하고, 이게 어떻게 신앙을 자라게 하는지, 소설을 읽을 때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한다.
소설 읽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하다
소설을 두고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소설은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삶을 대충, 가볍게, 피상적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준다. 좋은 소설을 읽고 나면 깊은 만족감이 느껴진다. 소설이 주는 행복은 바로 나와 세상을 알아가는 행복이다.
소설을 읽으면, 독자는 새로운 걸 깨닫거나 느끼는 순간 기쁨이 분출하고,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동시에 느낌과 시야를 통해 자신이 누구이고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게 소설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여행은 지루한 일상에서 잃어버린 감성을 가장 빠르게 되찾는 방법인데 소설은 여행이 주는 그런 발 빠른 만족감을 준다. 감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쁨이 아니라 의무로 살게 된다. 감성이 부족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감성을 개발하지 않는 신앙은 삶을 메마르게 한다.
소설 읽는 그리스도인은 성장한다
소설을 읽고 나면 영혼이 한 뼘쯤 자란 것 같다. 소설은 우리가 직면하는 고된 일상에 위로를 주고 동시에 자신과 타인이 살아가는 삶의 맥락을 깊이 들여다보게 만든다. 그래서 소설을 읽을수록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고 삶은 풍성해질 뿐 아니라 나를 둘러싼 세계와 하나님에 관한 계시에도 눈을 뜨게 된다.
문해력이 받쳐줘야 신앙도 업그레이드 된다. 문해력을 다들 원해도 손에 못 쥐는 건 이것이 독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책을 ‘깊이’ 읽는 내공을 가져야만 문해력이 주어진다. 문해력을 터득할 땐 소설을 읽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소설을 읽을 때 뇌에 주어지는 자극이 커서 독자는 공감 능력이 높아지고 세밀하게 읽게 된다. 이게 결국 문해력을 높여서 깊이 있는 생각을 가능케 한다. 문해력이 좋아지면 성경을 읽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다. 책을 가까이하면 겉모습은 노화되어도 뇌와 속사람은 새로워지게 되어 있고, 뇌가 새로워지면 우리는 한 알의 모래알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는 상상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소설이 필요한 이유이다.
소설 읽는 그리스도인은 상상하며 묵상한다
소설을 읽으면 독자는 인생을 두 번 살게 된다. 처음에는 그냥 살지만, 소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한 번 더 산다. 소설을 읽으면 주인공을 통해 배우기에 갈팡질팡하는 자신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다. 자신이 배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없다. 하지만 엔도 슈사쿠의 『침묵』을 읽었다면 만약 내가 로드리고 신부였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상상하게 된다. 작가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믿음이 있나 싶은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걸 안다. 그 순간을 상상하는 것으로도 내면에선 자기 점검이 일어난다.
소설은 내가 감동했던 장면이나 밑줄 친 문장을 통해 나의 속마음을 묻는다. 그때 나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소설은 등장인물의 삶의 자취를 따라가며 관찰하지만, 현실과 다른 게 있다. 어떤 일이건 원인과 결과가 있고 사건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소설을 다 읽고 나면 그런 판단을 조금씩 망설이게 된다. 바로 이런 순간이 묵상의 시작점이다.
소설 읽는 그리스도인은 내면이 단단해진다
놀라운 건 소설은 분명 허구인데도 우리의 뇌는 이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실제 사건을 겪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학습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소설을 읽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나를 돌아보게 한다
현실을 뒤집는 결정적 시선이 곳곳에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채지 못한다는 걸 작가는 안다. 바뀌려면 ‘다른 시선’이 필요하다. 소설을 꾸준히 읽으면 하나는 확실하다. 삶을 읽는 시선이 놀랍도록 깊어지고 넓어진다. 소설은 삶의 의미에 무디어지는 우리를 각성시킨다. 소설은 누군가의 실패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는데, 그게 마치 내가 돌봐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나’라고 말하는 것 같다.
고된 한 주를 버티게 한다
삶에 찌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깨우는 건 작가들의 전문 분야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막연한 듯해도 희망적인 뭔가를 주는데 그게 꼭 정답처럼 느껴진다.
성장판이 열리고 답을 찾는다
어느 날 소설의 등장인물도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이런 각성이 올 때 성장판이 다시 열리는 느낌이 든다. 신기한 건 밑줄을 그을 때마다 키가 자라난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 소설은 이 물음에 대한 작가의 답안지이다.
소설은 한 인물이 살아가는 삶의 자취를 보여주면서 그가 하는 시행착오를 통해 독자의 시야를 넓혀준다.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시선이 유연해야 한다. 사고가 유연해지면 작가가 말하지 않는 것도 읽어내는 눈이 열린다. 『더버빌가의 테스』를 읽으면, 소설은 내가 테스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를 고민하게 한다. 이런 고민하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안 보였던 게 보인다.
얼마 전 너새니얼 호손(Nathaniel Hawthorne)의 『주홍 글자』를 읽었다. 추상적으로 느껴지던 ‘죄’의 실체가 눈에 보였다. 마리오 푸조(Mario Puzo)의『대부』를 읽으면서 인간 본성의 민낯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이 소설을 읽으면 인간을 이해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 꿀 한 숟가락 몰래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라는 저자의 말에 공감이 되고 여운이 잔잔하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