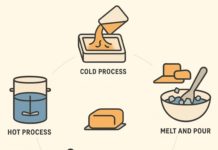초등학교 4~5학년 즘이었던가, 축구를 너무나도 좋아했던 나는 점심시간마다 흙먼지 가득한 운동장을 누비고 다녔다. 실력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생머리에 가마가 하나인 애들이 뛰어 다닐 때마다 머리가 찰랑찰랑하는 것을 부러워했던 반 곱슬의 쌍가마 소년이 바로 나였다.
그러나 운동에 딱히 소질이 없는 것 같은 나도 두각을 드러낸 종목이 있었으니 바로 오래 달리기였다. 그때 당시 한 바퀴를 돌면 200m인 학교 운동장을 8바퀴 정도 돌아야 하는 1,500m 오래달리기에서 전교 3등으로 들어왔던 기억이 난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구력은 나름 좋았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이후로 달리기라는 운동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운동과 멀어지는 만큼 나의 뱃가죽과 등가죽의 사이도 한없이 멀어져 가며 나의 배둘레햄은 점점 지경을 넓혀가는 것 같았다. 거의 복음이 전파되듯이!
생각지도 못한 선한 영향력 받기
지난 4월, 런던으로 한 손님이 찾아왔다. 오랫동안 나와 함께 코스타 찬양팀으로 함께했던 동생인데, 현재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중에 런던에서 컨퍼런스가 있어서 겸사겸사 얼굴도 보고 함께 며칠이라도 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선택한 나라는 많은 사람의 꿈의 나라이자 행복지수 1위인, 바로 휘게(HYGGE)의 나라 덴마크였다. 북유럽 감성을 대표하는 말, 덴마크어로‘편안함, 따뜻함, 안락함’이란 뜻의 휘게(Hygge)를 속으로 휘게휘게 외치며 우리는 코펜하겐으로 향했다.
도착한 첫날 우리는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놀이공원이라는 티볼리 공원으로 달려가 즉흥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했다. 그런데 즐겁게 숙소로 돌아와서 다음 날 일정을 조율하는 중에 동생이 아침 조깅을 하러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흔쾌히 가겠다고는 했지만, 속으로는 살짝 투덜이 스머프가 되었다. 다른 곳들을 돌아다니기만 해도 체력이 모자랄 것 같은데 여행까지 와서 운동이라니! 아침이 되어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 근처에 있는 호숫가를 한 바퀴 돌며 운동을 했다.
북유럽 감성에 흠뻑 취한 동생은 중간에 쉬면서 턱걸이도 3세트나 해내고 있는데, 3km 정도 되는 거리를 오랜만에 뛰려니 나의 몸이 도저히 적응하지 못하고 헉헉대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찾아온 느낌이 있었는데, 예전에 오래 달리기를 하며 숨이 문턱까지 차오를 때 계속 버티며 달리다보면 찾아오던 일종의 ‘희열’같은 것이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흐르며 둘러싸고 있는 풍경들을 바라보고 또 느껴보니 맑디맑은 공기가 꼭 뉴질랜드 남섬 퀸스타운의 아침 공기 같은데, 주변 건물들은 마치 중세의 어느 시절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 중후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세월의 관록이 서려 있다.
비록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이것은 무언가 큰 전환점이 될만한 사건 이었다. 투덜거리면서 끌려 나오지 않았다면 절대 깨닫지 못했을 일이랄까.
착한 첫날 우리는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놀이공원이라는 티볼리 공원으로 달려가 즉흥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했다. 그런데 즐겁게 숙소로 돌아와서 다음 날 일정을 조율하는 중에 동생이 아침 조깅을 하러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흔쾌히 가겠다고는 했지만, 속으로는 살짝 투덜이 스머프가 되었다. 다른 곳들을 돌아다니기만 해도 체력이 모자랄 것 같은데 여행까지 와서 운동이라니! 아침이 되어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 근처에 있는 호숫가를 한 바퀴 돌며 운동을 했다.
북유럽 감성에 흠뻑 취한 동생은 중간에 쉬면서 턱걸이도 3세트나 해내고 있는데, 3km 정도 되는 거리를 오랜만에 뛰려니 나의 몸이 도저히 적응하지 못하고 헉헉대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찾아온 느낌이 있었는데, 예전에 오래 달리기를 하며 숨이 문턱까지 차오를 때 계속 버티며 달리다보면 찾아오던 일종의‘희열’같은 것이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흐르며 둘러싸고 있는 풍경들을 바라보고 또 느껴보니 맑디맑은 공기가 꼭 뉴질랜드 남섬 퀸스타운의 아침 공기 같은데, 주변 건물들은 마치 중세의 어느 시절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 중후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세월의 관록이 서려 있다.
비록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이것은 무언가 큰 전환점이 될만한 사건 이었다. 투덜거리면서 끌려 나오지 않았다면 절대 깨닫지 못했을 일이랄까.
덴마크에 또 언제 가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덴마크를 뛰어 보았다. 나의 뱃가죽과 등가죽이 다시 연락을 취하며 가까워지기를 원하게 된 사건이었다. 휘게 라이프,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음을 알려준 어느 한 동생의 선한 영향력.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겠지.
뉴질랜드에서 달린다는 것
그러고 보니 15년 가까운 시간을 뉴질랜드에서 사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새벽에 일어나 뛰어본 적이 없었다. 대중교통은 별로여도 차를 타면 언제 어디든 갈 수 있는 오클랜드 아니던가. 덕분에 도리어 게을러지고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싶어 그 동안 뭐 했지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잠시 5월에 휴가차 뉴질랜드에 있을 때, 덴마크에서 함께 뛰었던 것들이 생각나서 이 동생을 불러내 타카푸나 비치를 함께 뛰었다. 그리고 나의 후회는‘확실한 후회’가 되었다. 차 타고 10분이면 올 수 있는 이런 곳에 와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뛰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펐다.
그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부럽다. 물리적 거리는 내가 더 멀지만, 타카푸나 조깅과의 마음의 거리는 아마 내가 여러분보다 더 가까울 지도 모르겠다.
언젠가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게 된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매일 마시는 뉴질랜드의 똑같은 공기도 매일매일 새롭게 감사하며 마실 수 있을 것 같다. 로토루아 레드우드 숲의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걷고 싶다. 단 한 번의 숨도 당연하게 쉬고 싶지 않다.
심장에 떨림을 들으며 가기
런던으로 돌아와 나는 제대로 뛰기 시작했다. 동기부여를 위해 운동복에 투자도 좀 하고 9월에 왕립식물원(큐가든 Kew Garden)에서 열리는 10km 달리기 행사에도 도전해 보기로 했다. 처음엔 3km도 힘들더니 두 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 이제 5km 정도는 무리 없이 달릴 수 있게 되었다.
실력이 늘며 뱃가죽과 등가죽도 접선을 시도하고 있고, 체력도 많이 늘어서 회사에서 오래 일하는 날도 전처럼 피곤하지 않은 선순환에 올라탄 것 같아 감사하다. 하지만 그 중 제일 좋은 점이 있다면 머릿속을 떠돌던 복잡한 생각들이 명징하게 정리되는 것을 느낄 때이다.
마치 나는 왜 런던에 있는지,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뛰고 있는지, 이 싸움을 해나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늘에 대고 묻고 답을 얻는 일 같다. 하늘은 태연하게 ‘나는 계속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땀을 흘리며 심장의 떨림에 맞춰 계속 간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숨을 들이쉬며 보고 싶은 이의 얼굴을 계속 떠올려 보기도 하는 시간. 내겐 다리 떨리는 시간이 아닌, 가슴 떨리는 시간이다.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 나게 억울하겠죠
일등 아닌 보통들에겐 박수조차 남의 일 인걸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SES의 ‘달리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