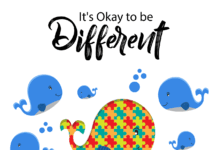어느 날부터인가 왼쪽 위 사랑니 하나가 묵직하게 뻐근해지더니 점점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이가 아프거나
잇몸이 아픈 적이 없는지라
사랑니가 아픈 건지,
잇몸이 아픈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치과에 예약을 하려 했더니
한달 반 후에나 오라 합니다.
그 사이에 잘 관리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정성스레 양치질도 하고
소금 가그린도 열심히 하면서
아픈 이에 정성을 드렸습니다.
더 아픈 것도 아니고,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닌 것이
그냥 그냥 지낼 만 합니다.
“오늘 치과 가는 날인데 같이 가요, 나 무서버!
이 뽑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오늘은 아마 엑스레이 찍고 검사만 하고
뽑더라도 다음에 뽑을 거야. 걱정 말고 가.”
이 여러 개를 뽑아 본 선배(?) 말을 철떡 같이 믿고
혼자 절대 병원 안가는 나는
보무도 당당하게 혼자 치과를 찾았습니다.
“왼쪽 위 사랑니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잇몸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 입을 벌리고
입 구석구석 엑스레이를 찍은 후에
의사 선생님 말씀 합니다.
“왼쪽 위 사랑니가 좀 썩어서 옆에 어금니를 망칠 수 있으니까
썩은 사랑니를 뽑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에~?”
순간 앞이 캄캄! 그리고 아들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이 뽑을 때 마취주사 두 대를 맞아요.
한 대는 뽑을 이 있는데 놓고, 한 대는 입천장에 놔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주사 한 대도 기겁할 판인데 두 대를 맞아야 한다니..
“선생님, 오늘 꼭 뽑아야 하나요? 마취주사는 몇 대 맞나요?
입천장에도 놓는다면서요?
남편이 엑스레이만 찍을 거라 해서 혼자 왔는데요…
갈 때 운전해도 괜찮아요? 제가 주사를 좀 많이 무서워해요.
그리고 아직 이 뽑을 마음의 준비가 안되어서요…
다음에 남편이랑 같이 올게요.”
속사포로 쏟아내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선생님의 표정은 딱 이 표정!
“아줌마 몇 살?”
결국 선생님의 회유(?)에 넘어가 이 하나를 뽑기로 했지만
주사바늘을 들고 덤비는(?) 선생님을 보자
온 몸이 뻣뻣해지고 볼까지 딱딱해집니다.
“힘 빼세요. 애 낳는 거 아닙니다.
팔다리 힘 빼시고
볼에도 힘 빼세요.
따끔할 거에요. 괜찮습니다~.”
참내, 나보고 그 말을 지금 믿으라고라?
덜덜덜 떨며 첫 번째 주사를 맞았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두 번째 주사를 입천장에 맞았습니다.
오호!
믿을 만한 선생님이십니다.
정말 첫 번째 주사만 따끔할 뿐
두 번째 주사는 이미 입천장이 마취되었는지
감각도 없습니다.
쑤욱~! 빠지는 듯한 느낌과 동시에
평생 함께 동행했던 이 하나가 쑥 빠져 나갔습니다.
앓던 아픔과 함께 시원하게…
평생 나와 동행했던 죄악의 쓴 뿌리들도
이렇게 시원하게 쑤욱~ 빠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앓던 이 빠진 것처럼 시원하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