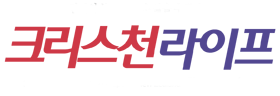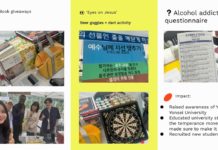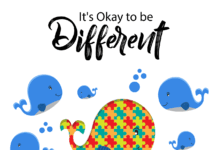부부가 잠시 따로 살기로 했다
편성준, 윤혜자 부부가 한 달 동안 따로 살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각자가 쓴 일기를 하나로 엮어 에세이《여보, 나 제주에서 한 달만 살다 올게》(경기: 행성비, 2021)를 출간했다. 이 부부가 한 달 동안이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 부부에게 이 시간이 힘들었을 터인데 왜 이들은 따로 살고자 했을까?
나사를 푸는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날 남편이 집 현관문에 헐거워진 경첩의 나사를 조이고 있었다. 나사를 돌리다 보니 문득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자신은 나사를 한 번도 풀지 않고 계속 조이기만 하며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20여 년간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로 일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 수십 년 넘게 착 달라붙어 살아왔으니 이젠 나사 좀 풀고 살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퇴직했다.
아내가 남편이 제주에서 한 달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이 시간은 남편이 그동안 직장에 묶여 있었던 삶의 짐을 내려놓고 ‘나사를 푸는 시간’이었다. 남편에게 이 시간은 다시 올 수 없는 자유의 시간이자 선물 같은 나날이었다.
한 달간 남편은 제주에서 숙소 주변을 산책하고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읽으며 글만 썼다. 음식은 말하는 밥솥과 인스턴트로, 가끔은 커피와 술을 벗 삼아 마셨다. 회사는 그만두었지만 돈 걱정은 한 아름이었다. 부부는 서로 외로웠지만, 떨어져 있던 시간동안 ‘자발적 고독’ 연습을 했다.
외로움과 고독에는 차이가 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한 것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라고 했다.”
“박준 산문집에는 선배 시인이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감정 같아’ 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맞아, 나는 외롭고 싶어서가 아니라 고독해지려고 제주까지 온 것이다. 그러니 고독하되 외로워하진 말자”고 이야기한다.
프랑스 작가 마르그리트 뒤라스는 ‘고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책을 쓰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항상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고독이다. 그것이 저자의 고독이고, 쓰기의 고독이다.”
‘외로움’은 하나의 감정이다. 혼자 있을 때나 주변에 사람들이 잔뜩 있다가 다 사라지고 혼자 남겨질 때 느끼는 감정이다. ‘고독’은 의지적인 행동이다. 나 스스로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 홀로 있고 싶다는 마음의 결단이다. 남편이 꽉 조인 나사를 풀러 제주로 떠나고 자발적으로 혼자 있기를 선택한 것이 바로 고독이었다. 남편은 고독했지만 자신에게 집중하는 생산적인 시간이었다. 남편은 제주에서 보낸 한 달 동안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라는 책의 초고를 완성할 수 있었다. 또한 매일 일기도 쓰고 브런치에도 글 43개를 써서 올릴 수 있었다.
남자에게는자발적 고독이 필요하고 여자에게도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나이 든 남자에게는 ‘동굴’이 필요하다고 한다(물론 여자에게도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현대인들에겐 누구나 고독해질 권리가 있는 것이다. 회사를 그만두고 고독을 위해 제주도 별장으로 떠났다. (…) 그래, 일단 떠나는 거야. 나는 제주도지만 그게 설악산이면 어떻고 하와이면 어때. 중요한 건 가족이나 일에서 멀리 떨어지고 보는 것이지. 영어에도 있지 않은가. Out of sight, out of mind.”
남편은 제주에서 외로움을 만끽했지만 전혀 쓸쓸하지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독이었기 때문이었다.
고독할 틈이 없는 분주한 삶
요한 하리의《도둑맞은 집중력》에 따르면, 미국의 10대들은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 집중하지 못하고 직장인의 경우는 평균 집중력이 3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지루하면 견디지 못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를 돌아보는 고독의 시간이지 않을까?
우리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
신앙생활은 누군가와 늘 함께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 고독하다.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도 고독하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도 고독하다. 우리는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청중이 받아먹기 쉽도록 미리 요리한 말씀이다. 설교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자가 호흡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나 혼자의 힘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삶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시간이 진짜 고독의 시간이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신앙생활의 고독함이 나에게 밀려온다. 하지만 이때가 비로소 내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고독의 시간을 즐겨라. 고독은 나를 단단하게 채우는 시간
비평가이자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1856-1950)는 자신의 인생을 희극으로 잘 연출한 사람이다. 그는 삶의 끝자락에 “내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의미심장한 묘비명을 남겼다. 이 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역설적인 경고처럼 보인다.
뉴질랜드에서 특별하게 밤 문화가 없다 보니 하루하루가 쏜살같이 흘러간다. 어영부영 하고 지내다가 10년, 30년의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가버리기가 쉽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아껴야 한다.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은 18년간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했다. 정약용은 유배생활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고독의 시간으로 활용했다.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는데 집중했다. 유배생활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집필했다. 그가 이 일에 얼마나 집중했던지 복사뼈가 세 번이나 구멍이 났다고 한다. 정약용의 유배생활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고독의 시간이었다. 그 고독의 시간 덕분에 정약용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는 《다산선생 지식 경영법》에서 정약용의 이 유배생활을 “조선 학술계를 위해서는 벼락같이 쏟아진 축복이었다”고 평가했다.
좋은 글은 좋은 삶에서 나온다
좋은 삶은 나를 돌아볼 때 가능하다. 나를 돌아보는 것은 고독의 시간을 가질 때이다. 혼자가 되는 것은 삶의 일부이며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고독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다. 고독의 시간을 가질수록 내 내면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고독을 즐기며 살아가자. 그래서 자신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