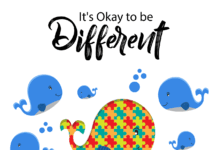‘거기 그녀는 빌려온 사람처럼 낯설게 서 있습니다.’
릴케의 시(詩) ‘여인의 운명’ 중 마지막 연의 한 구절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이 시를 읽어 나가다 이 구절에 와서 저는 그만 강한 전류에 감전된 듯 한참 동안 얼이 빠져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한때는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젊음이 있었겠고 부풀어 오르는 꿈을 가슴에 담고 온통 세상을 휩쓸며 돌아다녔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그녀를 보면서 부러움과 시샘으로 쳐다보던 다른 여인들의 눈길들도 있었을 터이고 또는 사랑이 고파 그녀의 사랑을 얻고파 뜨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실어 보내던 뭇 남정네들의 눈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봄날이 마냥 길기만 할 수는 없듯이 여름이 나뭇가지에 달린 과실들을 익혀주는 뜨거운 태양 빛을 끝도 없이 보낼 수는 없듯이 세월은 갔고 어느 날 문득 그녀는 ‘거기 그녀는 빌려온 사람처럼 낯설게 서 있습니다’처럼 서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 있던 어느 순간 그녀는 시인의 눈에 뜨여 한 구절의 시가 되었고 이 시를 읽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지금도 ‘빌려온 사람처럼 낯설게 서 있습니다’.
이곳 지구 끝 남쪽 나라 뉴질랜드에도 길던 여름이 끝나가면서 저녁 풀벌레 소리와 더불어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반구의 환절기만큼 확연한 계절의 변이는 아니더라도 노랗게 잎사귀가 물들어가는 은행나무들로부터 조금씩 다가오는 가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맘때면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볼 때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는 어떤 자세로 서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모습도 눈 밝은 시인의 눈길 속에 들어가면 ‘빌려온 사람처럼 낯설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닐지요?
아무리 바쁘고 또 번잡하기만 한 삶 속이라도, 이 지구촌 어느 알지도 못하는 먼 곳에서 생긴 작은 사건 하나가 이제는 우리 일상에 금방 영향을 주는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남의 눈치를 살피기에 너무 바빠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매일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빌려온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초대받은 사람’-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창조주에게서-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동물을 지은 뒤에 그것들 모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와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짓게 하신다는 것은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권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도록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이 계절의 모퉁이에서 우리 모두가 창조주에게 ‘초대받은 사람’으로 자신 있는 삶의 자세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깊으면 봄이 오고 그 봄이 지나면 또 여름이 오는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만 갖춘다면 우리 모두의 삶은 ‘빌려온 사람’의 삶이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의 삶으로 바뀔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어느 날 오후, 아내와 더불어 데본 포트 바닷가 길을 거닐다가 상쾌하게 코를 스치는 가을바람을 만났고 위로하듯 따뜻하게 등 뒤를 어루만지는 가을 햇볕을 느꼈고 그러다 우리 두 사람의 앞을 소리도 없이 앞장서 인도하는 우리들의 그림자가 무척 길어진 것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가을은
벽옥보다 푸르른 하늘을 제 맘대로 날아다니다
흰 구름의 무리를 만나자
마침 쏟아져 내리는 햇볕과 더불어 마음껏 장난질을 치다
무엔가 심심했던지
쏜살같이 땅으로 곤두박질 쳐내려 오다
키 큰 나무들과 만나
저만치 높이에서 그 잎사귀들과 깔깔거리는
부산한 바람이다
가을은
금빛 뚝뚝 듣는 치맛자락 두 손으로 펼쳐 들고
불어오는 바람과 만나
온통 숲 속을 휘젓고 다니다가
만나는 나무마다 꽃마다
치마폭으로 감쌌다 놓아주며 숨바꼭질을 하다
저도 몰래 벌여놓은 색깔 잔치에 스스로 놀래
바람 먼저 보내고 뒤에 남아있다
놀랜 눈 크게 뜨고 엎드린
숲 속 작은 동물들의 등허리 위로 내려앉는
아직은 따사로운 햇볕이다.
그리고 가을은
지난 계절 내내 극성부리던 태양 빛에 질려
기지개 한번 제대로 못 피고
줄어들고 졸아들다 겨우겨우 발치에 달라붙었다
떨어져 내리는 나뭇잎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살며시 손 내밀어 땅바닥 만져보고
살며시 목 내밀어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젠 괜찮아 이 정도면 그렇게 뜨겁지 않아
비로소 마음 놓고 허리 펴고 모가지 내뻗으며
온전해져 돌아와 앞장선 우리 모두의 그림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