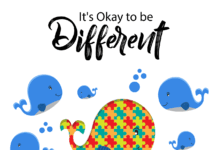몇 년 전 봄에 뉴질랜드를 떠나 아내와 같이 꼭 100일 동안 여행을 한 적이 있다. 100일간의 여행은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었지만 무사히, 그리고 나름대로 보람 있게 지내다 왔기에 지금도 가슴이 뿌듯하다.
그 중에서도 3주 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녔던 남 프랑스의 동화 같은 마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직도 삼삼하게 눈에 어리고 귀국하기 직전에 5박6일 동안 들렸던 제주도의 정겨운 모습들도 가슴 속에 그냥 남아있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던 하루 하루였지만 그러나 여행을 통해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아내의 소중함이었다. 나의 삶에서 언제나 그렇듯이 그 100일 동안의 여행에서도 아내는 사랑스럽고 충실한 동반자였다.
한국에서나 프랑스에서나 아내는 그림자같이 내 곁에 있었고 잠시라도 내가 한눈을 팔다 아내가 어디 있나 두리번거리고 있으면 어느새 곁으로 다가와 다정한 미소와 더불어 내 손을 잡아주었었다.
아, 그때마다 온몸을 충만케 하는 사랑의 느낌은 말로도 글로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그런 아내를 여행 도중 때때로 내 욕심만 채우려 괴롭혔던 것 같아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미안해진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5월 파리의 오르세이 미술관(Musée d’Orsay) 앞에서 표를 사기 위해 2시간을 줄 서서 기다려야 했지만 아내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내 곁을 지켰다.
갑자기 내리는 빗줄기를 피하기 위해 길거리 우산 장사에게 2유로 주고 산 비닐우산은 우리 두 사람을 비바람으로부터 막아 주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었지만 아낸 그 보잘것없는 우산 아래서 잘 참고 버티었다.
워낙 추위를 잘 타는 아내가 안쓰러워 “비 오는데 그만 갈까?” 하고 내가 묻자 아내는 “당신 좋아하는 곳이잖아요. 기왕 기다렸는데 보고 가요. 이것도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하며 오히려 내 손을 꼭 붙잡았다. 아마도 아내가 아니었으면 나 혼자서는 그 비바람을 끝까지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제주도에 갔을 때였다. 루게릭병으로 요절한 사진작가 김영갑의 갤러리에 갔다가 그의 사진들에 반해 그가 살아생전 오르내리면서 사진을 찍었다던 중산간의 용눈이 오름을 가봐야겠다고 내가 말하자 아내는 말없이 마실 것과 간식거리를 챙겼다.
그 덥고 습한 날 나무 그늘도 거의 없는 용눈이 오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갈 때도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 곁을 지켜 주었다.
‘아무리 셔터를 눌러도 사진 찍을 것이 무궁무진한 곳이 용눈이 오름’이라고 말한 김영갑 작가의 말을 기억하며 나도 이곳저곳에 카메라를 들이댔지만 감각이 무딘 나는 한 열 컷 찍고 나니 더 찍을 곳이 마땅치 않았다.
공연히 미안해서 아내를 바라보았더니 아내는 “위에까지 올라오니 바람이 시원하네요, 그렇죠?” 하면서 나를 보며 웃었다. 그저 고마울 뿐이었다.
영원한 반려자 아내
요즈음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부쩍 많이 나돈다. 젊은 사람들의 이혼율도 높지만 그에 못지않게 나이 든 부부들이 많이 갈라선다고 한다.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젊어서 성급한 마음에 이기적인 생각에 잘 못 갈라섰다가도 나이 들면 오히려 서로 이해해 주고 다시 합치지는 못할 망정 이제 몸도 마음도 쇠잔해 가는 노년에 갈라선다는 것은 무조건 최악의 선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조금만 더 서로 이해만 해준다면 부부가 서로를 정말로 필요로 할 때는 젊어서가 아니라 같이 늙어가는 노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힘도 달리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순발력도 아둔해지는 이때 서로 돕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온 부부가 노년의 부부이다.
눈빛만 보아도 표정만 보아도 무슨 말을 하려는 지 무얼 하고 싶어 하는지 서로 아는 부부가 노년의 부부이다.
우리 부부도 요즈음은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무언가를 생각해내려 할 때 도저히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깔깔 웃고 만다. 그 무언가의 이름이 생각은 안 나지만 무얼 말하려는 지는 이미 서로 알기에 그냥 웃고 넘어간다.
제주도에서 거문 오름에 갔을 때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만큼이나 숲길이 좋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둘이서 열심히 걸었다. 숲이 점점 깊어지고 들이쉬는 숨이 너무 달기에 내가 아내에게 말했다.
“굉장히 상쾌하지. 근데 이런 숲에서 나무가 뿜어내는 그 좋은 기운을 뭐라고 했지. 치, 뭐였는데?”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음,그거 치토산 아녜요?’ “에이 치토산은 아니고,” 하고 이번엔 내가 받았다.
그런데 나도 생각이 안 나기는 마찬가지였다. “치커리 아니던가?” “에이 치커리는 더 아녜요,”하고 이번엔 아내가 깔깔거렸다. 우린 둘 다 그게 뭔지는 알고 있었지만 생각해내려고 애쓸수록 더욱 생각이 안 나고 괜한 ‘치’자로 시작되는 말들만 이것저것 주어 대며 숲길을 걸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산림관리원을 만났다. “이봐요, 젊은 양반! 말 좀 물읍시다.” 하고 내가 말을 걸었다. 눈이 동그래져 쳐다보는 관리인에게 “그 있잖소, 숲에서 나오는 몸에 좋은 기운을 뭐라고 하지요?”하고 묻자 “아 어르신, 피톤치드 말씀하시는 건가요.”하고 답했다.
그 순간 우리 부부는 둘 다 배를 잡고 웃었다. “맞다, 피톤치드.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났지?” “그래도 한 자 맞았네요. ‘치’자가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아내가 더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처음엔 잠깐 머쓱했던 관리인도 웃고 가버리고 우리 둘은 다시 손을 잡고 숲길을 걸었다. 오르락내리락 길은 쉽지 않았지만 남은 길은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걸을 수 있었다.
내 손 속에 들어있는 아내의 작은 손이 더욱 귀하게 느껴졌고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가벼운 시상이 떠올랐다. 그 저녁 숙소에 돌아와서 적어보았다.
늘그막에 아내와
늘그막에
아내와 더불어 걸어가는 길
오순도순 손잡고 같이 가다가
때로는 아옹다옹
그래도 고맙기만 한 길
늘그막에
아내와 더불어 걸어가는 길
때로는 비 내리고 바람 불어도
손만 잡고 걸으면
그냥 고마운 길
늘그막에
아내와 손잡고 걸어가는 길
이렇게 작았었나 이렇게 따뜻했었나
새삼 느끼면서
같이 걷는 길
그래서 더더욱 고맙기만 한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