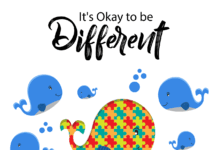벌써 1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봄도 가고 있습니다. 올봄은 코로나의 잔재와 같이 맞는 봄이어서 그랬는지 참으로 오기 힘든 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뉴질랜드에도 시시로 폭우 같은 비가 내렸고 봄 샘 바람이라기엔 지나치도록 차고 시린 바람이 끈질기게 불었습니다. 그래도 그 비와 바람을 뚫고 봄은 왔었지만 오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봄이 훌쩍 떠나버릴 시기를 맞으니 문득 최영미 시인이 ‘선운사’라는 시에서 지는 동백을 보고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이라고 탄식하듯 읊었던 구절이 생각납니다.
동백은 꽃이 질 때 꽃잎이 한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송이째 떨어집니다. 지난 3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도 이번엔 지는 동백처럼 송두리째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엔 힘들게 왔다 너무 빨리 가버리는 봄이지만 가면서 코로나의 마지막 잔재까지 그 매섭던 바람으로 몽땅 휩쓸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늦봄에 들어야 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 가장 유명한 ‘봄’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5번‘봄’작품 24번
베토벤은 모두 10개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작곡했습니다. 그중 처음 세 곡(작품 12의 1, 2, 3곡)은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곡들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곡인 작품 23부터는 베토벤의 개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이 곡으로부터 그의 바이올린 음악이 전환점을 맞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전환점의 문턱에서 처음으로 쓴 곡이 바로 제5번 소나타 ‘봄’이며 이 곡은 그의 제9번 소나타 ‘크로이쩌(Kreutzer)’와 더불어 모두에게 사랑받는 바이올린 소나타의 걸작입니다.
‘봄’이라는 제목은 베토벤이 붙인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무겁고 어둡고 격정적인 베토벤의 다른 소나타들과 달리 최소한 겉으로는 밝고 명랑한 이 곡을 듣고 누군가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붙인 이 이름이 이 곡의 성격과 맞아떨어지기에 지금도 ‘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작곡가이며 또한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던 베토벤은 바이올리니스트기도 했지만 그 연주 솜씨는 썩 훌륭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들으려는 바이올린 소나타 ‘봄’을 들어보면 그가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얼마나 사랑했고 또 잘 이해하고 있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봄’을 작곡할 때 그의 삶의 봄은 멀리 있었다
베토벤이 이 곡을 작곡한 때는 1801년입니다. 귓병이 점점 심해져 가서 절망의 어둠이 그를 감싸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다음 해인 1802년에 베토벤은 그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를 써 놓고 죽을 생각을 했으니 이 곡을 작곡할 때도 외로움과 절망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따뜻하고 밝은 곡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럴수록 삶의 봄에 대한 동경이 더욱 간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곡은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삶의 고난을 이겨 나가겠다는 그의 의지력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태어난 곡이기에 밝고 따뜻한 빛으로 충만해 보이는 이 곡의 이면에는 무어라 표현하기 힘든 슬픔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봄”을 작곡할 때 그의 삶의 봄은 멀리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두 4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곡 이전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모두 3악장의 구성이었는데 이 곡은 4악장의 확장된 형식입니다.
1악장은 바이올린의 선율로 시작합니다. 마치 제비가 날아들 듯 하강하다 다시 바람을 타고 상승합니다. 그 뒤를 받쳐주며 나오는 피아노 소리는 마치 작은 새들의 쫑쫑거리는 발걸음 같습니다. 베토벤도 이렇게 부드럽고 서정적인 면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음악이 계속되지만 뒤로 가면서 서서히 베토벤다움이 느껴집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느린 2악장은 반대로 피아노가 먼저 나옵니다. 곧 바이올린이 따라 나와 합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듯 아름다운 선율을 펼쳐나갑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어떤 슬픔이 묻어나옵니다.
따사로운 봄 햇볕 사이로 문득 어디선가 내려와 곱게 흩날리는 봄비와 같은 슬픔입니다. 이 아름다운 아다지오의 2악장을 들을 때면 미당 서정주의 ‘봄’이라는 시(詩)가 떠오릅니다.
복사꽃 픠고, 복사꽃 지고, 뱀이 눈뜨고, 초록제비 무처오는
하늬바람 우에 혼령있는 하눌이어, 피가 잘도라….
아무病도 없으면 가시내야. 슬픈 일 좀 슬픈 일 좀, 있어야겠다.
복사꽃 피고 지고 땅에도 하늘에도 미물들이 꿈틀거리는 평화로운 봄에 왜 시인은 ‘슬픈 일 좀 있어야겠다’라고 했는지 베토벤의 봄 소나타를 듣기 전까지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나 이 소나타를 들으면서 표면상으로는 아름답고 밝기만 한 선율 속에 들어있는 슬픔을 느낀 뒤엔 미당의 넋두리 같은 ‘슬픈 일 좀 있어야겠다’가 이해가 간 것입니다.
미당은 ‘슬픈 일 좀’으로 평화로운 봄을 지키고 싶었고 베토벤은 아름다운 ‘봄’ 소나타에 슬픔을 투영하므로 다음 해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로까지 이어진 죽음을 극복한 것입니다. 지나친 확대해석일지 몰라도 그렇게 느끼기에 이 소나타의 2악장을 들으면 미당의 ‘봄’이 생각납니다.
짧고 빠른 스케르초의 3악장은 어린 소녀의 깔깔거리는 웃음과 같이 맑은 피아노로 시작됩니다. 곧이어 바이올린이 합세하며 서로 쫓고 쫓기며 희롱하듯 하지만 현(絃) 위로 미끄러지는 활이 그어내는 바이올린의 소리는 때로는 신음같이 들립니다. 베토벤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울음소리입니다.
피아노의 밝은 울림으로 시작하는 론도의 4악장은 그 분위기가 1악장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전 악장에서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뛰놀 듯 주고받던 소리의 배합은 여기서 많이 차분해집니다.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고 화사한 선율을 생각해냈는지 감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의 깊은 곳 군데군데에는 흐릿한 비감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피날레 악장이 끝납니다.
이 곡을 작곡하는 동안 베토벤의 귀는 급격하게 나빠졌지만 그는 그 사실을 숨기고 안으로 안으로 삭였으니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 지 상상이 갑니다. 그런 산고를 겪고 나온 곡이니 겉으로 보이는 밝고 화사함 속에 슬픔이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1801년에 발표된 이 곡은 후원자인 모리츠 폰 프리스(Moritz von Fries) 백작에게 헌정되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연주라는 Oistrakh(Vn)/Oborin(P)의 연주
유명한 작품인 만큼 좋은 연주도 많습니다. 아주 오래된 연주이지만 Francescatti(Vn)/Casadesus(P)의 연주는 아주 신선합니다. Busch(Vn)/Serkin(P)의 연주는 더 오래 되었고 모노이지만 아주 개성 있는 연주입니다. 특히 Busch의 바이올린에서는 베토벤의 슬픔이 묻어나옵니다.
화요음악회에서는 이 곡의 가장 모범적인 연주라는 Oistrakh(Vn)/Oborin(P)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Oistrakh의 바이올린은 중후하고 따뜻하며 Oborin의 피아노는 정숙합니다. 몇 번을 들어도 다시 듣고 싶은 연주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날 같이 본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누구에게 의지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불안과 절망 속에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베토벤의 믿음의 깊이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가톨릭 교구에서 세례를 받은 기록이 있으니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랬기에 청력이 없어지는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