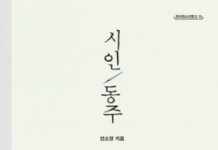“산미(酸味) 없애는 것 잊지 말고!”
단골 카페 사장님이 로스팅 하다가 혼자 되뇌인다. 보통 ‘신맛(Sour)’으로 대변되는 ‘산미(酸味)’를 잡기 위해 커피를 볶으며 혼자 다짐하는 것이다. 산미는 고급 커피의 생명줄과 같은데 무슨 돼지고기 잡내 잡듯 하냐며 면박을 줬다. 그런데 손님들이 싫어한댄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손님이 원치 않는데 어쩌냐는 것이다. 왜 한국 커피 소비자들은 여전히 커피의 산미(酸味), 즉 ‘신맛’을 낯설어할까?
커피는 제1, 2, 3의 물결로 나뉜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정보화 시대를 ‘제3의 물결(The Third Wave)’로 표현한 것을 커피의 유행에 인용한 것이다.
제1의 물결은 ‘네스카페’(Nescafe)와 ‘맥심’(Maxim)’같은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들이 주도했다. 추출의 기술적 장벽을 대폭 낮춤으로써 대중의 일상 속으로 커피가 스며들 수 있게 했으며 맛과 향보다도 카페인 섭취가 주목적이었다.
제2의 물결은 스타벅스와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주도했다. 에스프레소를 중심으로 응용된 다양한 커피 메뉴를 대중에게 선 보임으로서 단순한 식 음료를 뛰어넘어 컨텐츠로써 커피를 진일보시켰다.
제3의 물결은 현재 진행형인데 블루 보틀(Blue Bottle) 같은 스페셜티 전문 기업과 개인 로스터리들이 주도하고 있다. 커피 열매는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따라 맛과 향이 전부 다르다. 제3의 물결에서는 이런 원두의 특성에 맞는 로스팅과 추출을 통해 더 특색있는 커피를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단순히 내 앞에 놓인 한 잔의 커피가 아닌 ‘원두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제2의 물결과 3의 물결 사이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몇몇 대도시는 3의 물결을 타고 순항 중이나 그 외의 대다수 지방 소도시들은 여전히 2의 물결 안에 있다. 그렇다면 현재 다수의 입맛을 형성하고 있는 ‘제2의 물결 커피 맛’은 과연 과연 어떤 맛일까?
1999년 스타벅스 1호점이 이대 앞에 문을 열었다. 믹스커피와 다방문화가 전부였던 당시, 글로벌 감각의 세련된 디자인, 편안한 공간, 다양한 메뉴 등을 선보인 스타벅스의 등장은 일종의 혁명이었다. 국제화 시대를 열고자 했던 흐름과 해외 유학파들을 중심으로 퍼져 나간 스타벅스는 이후 파죽지세로 성장, 현재 전국 1,460개의 매장과 4천8백억의 매출을 기록하는 공룡기업이 되었다.
스타벅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국내 커피 문화에 기여했다. 앞서 언급한 세련된 분위기와 장소, 다양한 커피 음료 제공은 대중들에게 ‘술’ 없이도 즐거운 교제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개인의 사색 공간 및 독서공간, 일터까지 제공함으로써 대체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소화해냈다.
카페 애호가로서 스타벅스를 포함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지금의 커피 문화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지갑의 여유를 앗아간 것만 제외하고. 반면 커피의 맛을 획일화시킨 것도 사실이다.
스타벅스의 철학은 스타벅스 커피 맛을 전 세계 어느 매장에서도 똑같이 맛볼 수 있게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선 미국 본사로부터 원두를 들여와야 했는데 멀리서 들어오는 원두의 신선도는 자연스레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더 강하게 커피를 태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 스타벅스 음료는 모두 이 강배전(Dark Roast) 원두를 기본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 강배전 원두의 맛이 대중에게 확산되어 ‘쓴맛, 탄맛’을 커피의 기준으로 심어 놓았으니 당연히 산미가 살아있는 ‘신맛’은 대중들에게 낯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한 경우 ‘맛없는 커피’라는 악평까지 내리는 분들이 있는 걸로 보아, 스타벅스가 심어 놓은 입맛의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 하다고 볼 수 있겠다.
더 깊고 다양한 원두 세계를 선보이고 싶어 하는 커피 장인들은 이 ‘획일화’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도 치열하게 노력 중이다(현재 스타벅스도 현지에 로스팅 공장을 세우고 다양한 원두로 추출한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을 운영하며 제3의 물결에 합류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개인의 입맛’이라는 것도 한 번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성되기보다는 외부의 영향과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반영되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릴 적 다닌 교회는 장로교회였다. 교회는 담임목사님이 직접 개척한 교회였기에 장로 교단의 방향성과는 무관하게 목사님만의 독립적 목회 철학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지금도 선명히 기억에 남는 것은 목사님의 축도이다. 축도 때마다 목사님은 “한 달에 백만 원! 천만 원! 일억의 십일조를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외쳤다. 그리고 설교 중에는 “내 집 짓고! 내 차 타고! 내 사업하는 인생을 삽시다!” 고 독려했다.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쓰임 받는 목사가 될 것이라 선포했고 송구영신예배 때는 그런 목사님께 별도로 준비한 헌금봉투를 내밀며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연말 행사였다.
교회에서 이뤄지던 간증은 대부분 ‘기도하고 십일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살았더니 큰 부를 주셨다’는 식의 내용들이었다. 나도, 부모님도, 형제들도 이런 흐름 속에 자연스레 ‘신앙관(Faith view)’이 형성되었다.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은 부와 성공을 약속해주는 분이었고 병 들거나 가난한 것은 일종의 ‘죄’에 가까웠다. 하나님은 내게 일종의 ‘기업인’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잘 섬기는 이들에게 ‘성공’이라는 주식을 통 크게 나눠주시는 그런 이미지였다.
당연히 나는 세속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삶을 꿈꿨고 그랬기에 그 하나님의 눈에 들고 이쁨받고 싶었다. 당시 나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교회는 늘 뜨겁고 열정적이었다.
당연하게 여기던 물질적 신앙관이 무너진 것은 군대를 제대한 후이다. 제대 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바르게 읽게 되자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되어있음을 알게 됐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물질적 성공을 보장하신 적이 없었고(아주 제한적으로나마 그런 축복을 받은 이들도 있지만) 물질적 성공을 의미한다고 오해했던 대표적인 단어 ‘형통’이란 말도 내가 생각했던 의미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형통은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의미였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형성된 ‘번영신앙(Prosperity Gospel)’을 벗어내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여전히 벗어내는 중이다). 혹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지난 칼럼을 모두 읽은 분이라면 대략 짐작하셨으리라 예상된다. 내가 ‘앓는 소리’를 많이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예술가의 길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가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향한 정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기복이 심하다. 세속적 성공을 ‘욕망’하는 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아직도 고군분투 중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피날레가 ‘십자가’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다.
20년 가까이 믿던 나만의 피날레를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제대로 믿었다면 지금 같은 고충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7, 80년대를 수 놓았던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과 베이비 붐 세대의 인구증가. 경제 성장과 인구가 증가는 대도시를 형성했고 대형교회를 등장시켰다. 교회 수가 그리 많지 않던 당시, 도시 주변에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 와줬다 하는데 아마도 우리 목사님이 꿈꾸던 부흥도 이런 부흥이 아니었나 싶다. 왜냐면 목사님도 내가 살던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를 건축하고자 날마다 애쓰셨기 때문이다.
비단 교회만의 흐름도 아니었다. 당시는 대기업들의 성공 신화도 넘쳐났다. 매년 1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이루던 시기였고(2020년 현재 2.1%),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여행 자유화가 이뤄졌으며 OECD에도 가입하는 등 우리도 곧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교회 안에서는 부흥 신화가, 교회 밖에서는 성공 신화가 넘쳐나던 시기였다. 이 시기 속에서 나와 우리 세대들은 나름의 신앙적 기준을 형성해 갔다.
IMF를 맞이하며 신화도 끝이 났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기업인으로서의 하나님’도 신화들과 함께 사라졌는데, 환상이 사라진 빈터에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모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감사하게도 여기저기서 깨어있는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으며 이 과정을 통과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과정이 진짜 ‘부흥’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커피만큼은 제대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깨어있는 바리스타! 나의 단골 카페 사장님. 이미 오래 전부터 원두의 개성을 알리고 싶어 하던 선구자였다. 그로 인해 나는 프랜차이즈 커피가 커피의 전부가 아니란 것을 일찌감치 알았고 이 세계가 더 크고 넓다는 것을 배웠다.
커피만큼은 건강하게 첫 단추를 채운 느낌이랄까? 그 덕에 이렇게 커피와 신앙을 연결한 글도 쓰고 있으니. 물론 오클랜드에서 맛본 커피 장인들의 솜씨도 잊을 수가 없다. 뉴 마켓의 ‘Camper Coffee’와 시티의 ‘Espresso Workshop’, 노스쇼어의 ‘Coffee Lab’과 알바니의 ‘Albatross Coffe, Tob Coffee.’ 모두 나를 행복하게 해 준 카페들이다.
한 잔의 위안과 함께 커피라는 우주를 소개해 준 모든 바리스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2020년 칼럼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