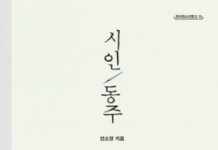리외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글로 쓰기로 결심했다. 그런 결심을 한 이유는 재앙에서 배운 교훈, 즉 인간에게는 경멸당할 것보다 찬양받을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알베르 까뮈(Albert Camus)의 ‘페스트’(The Plague)는 1947년에 출간된 장편소설이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94X년 4월16일부터 무슨 일인지 알제리(Algeria)의 오랑시(Oran)에서 쥐들이 죽기 시작했다. 당국이 쥐를 수거해 소각했는데, 열흘을 넘어서면서 그 수가 무려 8,000마리에 이르렀다.
사람 가운데 첫 희생자는 리외(Dr. Bernard Rieux)의 병원 수위였다. 그는 사타구니와 임파선에 염증이 생겨 붓더니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죽었다. 인구 20만 명인 오랑시에서 삽시간에 같은 증상의 사망자 수가 700명대로 증가하였다.
병의 정체는 페스트로 밝혀졌다. 역사적으로 30회에 걸친 대규모의 페스트로 약 1억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오랑시의 이번 페스트는 신종 페스트였다.
처음 오랑시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침내 도시를 폐쇄하기에 이른다. 인력이 부족하자 타루(Jean Tarrou)와 리외가 자원 보건대(sanitary squad)를 조직했다. 기자 랑베르(Raymond Rambert)와 파늘루 신부(Father Paneloux)도 보건대에 참여하고 공무원 그랑(Grand)은 통계작업을 도왔다.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환자를 격리하고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하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이들은 누군가 해야 할 그 일을 열심히 수행했다.
도시 폐쇄가 길어지자 탈출을 위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방화와 약탈 사건도 잇달았다. 식량배급이 줄어들어 시민들의 생활은 더욱 더 어려워졌다. 어떤 이는 이 와중에 밀매로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매장지가 부족해 큰 구덩이를 파서 시체를 한꺼번에 묻어버렸다. 땅이 모자라 화장을 했는데, 구역질 나는 짙은 연기가 시의 동쪽 하늘을 자욱하게 뒤덮었다.
의사 카스텔(Castel)은 신종 페스트를 물리칠 혈청(anti-plague serum)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했다. 카스텔의 혈청은 10월에야 임상실험을 할 수 있었다. 페스트 발병 6개월 만의 일이다.
오통(Othon) 판사의 아들이 첫 실험대상으로 선택되었다.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취하는 마지막 시도였다. 그러나 혈청주사는 실패로 돌아갔다. 아이는 리외, 타루, 파늘루 신부가 보는 앞에서 심한 고통 끝에 죽었다.
11월이 되면서 카스텔의 치료제가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무렵 페스트의 상승곡선이 비로소 수평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2월의 겨울 첫 추위에도 끈질기게 남아있던 페스트는 이듬해 1월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물러가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쥐들이 여기저기서 다시 나타났고, 통계 역시 페스트의 후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1월25일 저녁, 당국은 페스트가 사실상 퇴치되었단 발표를 하였다. 발발 9개월만의 일이다. 그러나 소설은 페스트균이 죽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으며, 앞으로 언젠가 다시 인간의 행복을 위협할 날이 올 것임을 경고하면서 끝을 맺는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주인공 리외가 무척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그의 관심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살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 죽는 것”이다. 그는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라고도 했다. 성실성이 뭔지 묻는 랑베르에게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라는 소박한 답변을 건넸다. 타루란 인물이 좀 특이하다. 오랑시에 여행객으로 왔던 그가 리외와 친구가 되고 자원 보건대의 리더로까지 헌신한다. 그는 기록을 좋아해 페스트 발병 초기부터 일기로 세밀히 기록을 남겼다.
타루에 따르면, 사람은 저마다 자신 속에 페스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은 실존주의의 주제인 부조리와도 연관이 있다. 평론가 중엔 까뮈의 페스트를 인류가 숙명으로 안고 있는 부조리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페스트가 영원히 죽지도 사라지지도 않을 것(The plague bacillus never dies or disappears for good.)이라고 끝맺음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해석과 무관하지 않다.
까뮈의 에세이 ‘시지푸스의 신화’(The Myth of Sisyphus)가 생각난다. 바위가 계속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부조리한 상황에서도, 시지푸스는 산 정상으로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그의 숙명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까뮈는 그러한 불굴의 인간형을 ‘페스트’에선 질병의 위협에 대항하는 리외와 타루를 통해 설정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소설예배자로서 우린 그 주제보단 파늘루 신부의 신앙적 변화에 더 주목하게 된다. 소설에서 그의 설교는 두번 등장한다. 처음은 페스트와 관련해 오랑시민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형식뿐인 신앙을 바로잡고자, 페스트란 재난을 허용하셨다는 설명이었다.
그랬던 그가 오통판사 아들의 혈청 임상실험 현장에 참석하면서 깊은 고뇌에 빠져들게 된다. 죄 없는 어린아이가 왜 고통 속에서 죽어야 하느냐는 리외의 항변이 온통 신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러나 파늘루는 이 일로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갔다. 곧 무조건적인 순종의 신앙이다. 그는 두 번째 설교에서 “우리 앞에 몰아쳐 온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들이자”고 외쳤다. 모두 거부하든지 모두 받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 설교의 배경엔 오통판사 아들의 죽음이 있었다.
우린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을 잠깐 묵상해볼 필요가 있다. 창세기 22장에서 그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접한다. 이에 아브라함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바쳤다. 그때 하나님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창세기22:18)고 말씀하셨다.
이 점에 주목해보자.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이 천하 만민에 대한 복의 통로가 되었다면, 파늘루 신부 한 사람의 순종은 어떠한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처럼, 오통판사 아들의 죽음은 파늘루 신부에게 이해하기 힘든 고통이었다. 더구나 신부는 11월에 이르러 자신에게 다가온 병명미상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순종의 제물로 바쳐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파늘루가 그 일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 기적은 1월에 실제로 일어났다. 비록 카스텔의 혈청이 약효를 발휘했다고는 하나 아직 페스트를 제압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페스트가 제풀에 꺾여 물러간 것이다.
그러므로 ‘페스트’를 읽은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어떤 재난이 닥쳐도 인간은 리외와 타루처럼 불굴의 의지로 맞서 싸울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 재난을 물러가게 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어난다. 그리고 그 은혜의 문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열릴 것이다.
무신론자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를 읽으며 뜻밖에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으니, 이 또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