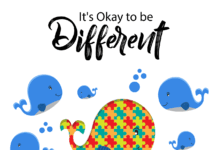영화 기생충은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라는 이동진 영화평론가의 한줄평에 걸맞게 보는 내내 묘한 느낌을 주는 영화였다.
어떤 사회적 계급에 대한 명제를 뚜렷하게 정의 내리기보다는 인생의 복잡 오묘하지만 적나라한 모습들을 날것 그대로 영화라는 쟁반에 내놓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런 사회적인 계급 격차와 갈등 같은 것들은 태초부터 존재했다.
성경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만 보아도 그렇고, 아마도 석기시대에 수렵 채취를 하며 자급자족하던 시대에도 존재했을 것이다. 누가 더 큰 동물을 사냥하였는가, 누가 더 많은 사냥감을 획득하였는가로 인해 서로 시기하고 싸우며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랬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 경쟁이란 단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피한 존재 같기도 하다.
다가오는 10km 단축마라톤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주말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열리는 5km 파크런(Park Run)에 참여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뛰다 보니 기록이 평소보다 좋게 나왔다.
나를 앞질러 가는 사람들에게 지기 싫은 마음이 작동하여 평정심을 잃고 평소 내 페이스보다 더 열심히 다리를 움직였던 것인지, 이틀을 쉬었는데도 다리가 당긴다. 이런 일이야 사소하다고 쳐도, 롤러코스터 같은 굴곡의 연속 속에 우리는 크고 작은 일로 지치고 절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럴 때마다 전도서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를 묵상하며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
천국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릴 적 가졌던 천국의 이미지는 가령 이런 것들이었다. 흰옷을 입고 풍요로움이 넘쳐흐르는 것 같은 강가를 거닐면서 다디단 과일을 한입 베어먹는다. 더 이상의 슬픔과 아픔은 존재하지 않고, 빛나는 황금 길을 걸으며 웅장한 황금으로 지은 집에 살면서 이것저것 누리는 행복만이 가득한 곳. 24시간 찬송을 부르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같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청년이 된 것 같다.
입시, 공부 스트레스, 진로의 문제 앞에서 고통과 눈물이 더 없는 곳에 대한 갈망을 붙잡고‘마라나타’를 부르짖었던 젊은 날을 돌아보면 참 단순했던 것 같기도.
몇 해전 청년부에서 천국에 대한 나눔을 가지던 중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한다. 자기는 저런 이미지의 천국이라면 너무 지루할 것 같다고, 더군다나 저런 천국에는 소.녀.시.대. 도 없을 텐데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누군가는 지금도 발칙한 생각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솔직한 고백이었고 시사하는 점이 있다.
만약 죽음 이후에 우리가 저렇게 신선놀음처럼 과일을 먹으면서 예배만(?) 드리는 천국으로‘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가?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행복이라 와닿지 않는 것일까? 이 땅에서 열심히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수고하며 집에서는 부모로 남편으로 아내로 아들과 딸로 살아왔던 그 모든 일은 과연 헛되이 사라지고 강가를 거닐며 하하 호호 하는 곳이 과연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일까?
나의 이 관념은 톰 라이트 (N.T Wright)-영국의 성공회 주교 겸 기독교 신양성서 학자-의 책‘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Surprised by Hope)’를 읽고 송두리째 바뀌었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죽음 이후의 ‘천국행’이 아니라 육체가 부활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이라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일은 헛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하는 작은 일 하나까지도 어쩌면 부활만큼이나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의 일부가 될 일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도 바흐의 음악은 계속 연주될 것이고, 어떤 화가가 기도와 지혜로 그린 그림은 어딘가에 걸려 있을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한다.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으셔서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궁극적인 미래의 삶 사이에 있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나는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 어떠한가. 지난날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며 모든 학업을 포기하고 신학교로 가려고 했던 일이 참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이원론적인 생각이었는지.
회계사로 런던까지 건너와 감당하게 된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성당의 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석상에 불과할지언정 그 일을 맡은 석공이 되어 돌을 다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삶을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인간 사이의 모든 경쟁과 갈등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살아내야 할 주의 일이라는 것을 알겠다.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그 영원의 첫 시간대에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음을. 함께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두 가지의 명제가 공존하는 세계, 곧 내가 소망하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인지도.
미생(未生)처럼 살아가기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인생이란 길을 발등 앞의 불빛만 의지해 한땀 한땀 수를 놓듯이 걸어가고 있다. 마치 바둑처럼 진행이 더디고 느긋할 수도 있는, 하지만 한방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영화가 될 수도 있는 불확실의 연속이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바둑돌을 놓는다지만, 자충수가 되어버리는 예측불허의 경험을 반복해 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돌을 깎고 있다. 완성된 성당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건축가(하나님)가 끝끝내 성당을 완성 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마치 미생(未生)-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처럼.
영원 없는 이곳에서 영원을 소망하며 이미 영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는 그 나라임을 믿는다.
브렉시트가 왔으나 브렉시트가 아직 오지 않은 이 영국이란 특이하고 신기한 나라에서, 오늘 몫의 일을 하며 나는 묵묵히 돌을 깎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