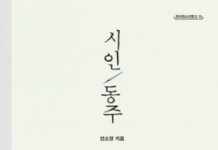비가 온다. 새카맣게 마음이 타버린 구름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한걸음에 빗물이 뛰쳐나오더니 이내 호수로 달음박질한다. 호수 물을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빗물이 저리도 단숨에 내리 달리는 걸까?
요나가 아빠에게 묻는다.
“아빠, 비는 왜 오는 거에요?”
아빠는 벌써 그런 걸 물어보는 요나가 대견스럽기만 하다.
“그걸 알려면, 갈릴리 호수가 처음 창조될 때로 돌아가야 돼. 원래 갈릴리의 하늘과 호수는 하나였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윗물은 구름으로 올려 보내고 아랫물은 호수로 만드셨지. 그렇게 서로 헤어진 탓에 하늘은 호수를 그리워한단다. 하늘 물이 호수 물이 그리워 밑으로 내려올 때 우린 그걸 빗물이라 부른다. 그렇게 빗물이 내리며 둘은 다시 하나가 되는 거란다.”
요나는 그렇게 아빠로부터 갈릴리 호수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갔다. 갈릴리 호수! 그 둘레가 얼마나 넓은지 아예 바다라고까지 불리는 곳이다. 지금 호수를 둘러싼 산과 들엔 연 노랑색의 겨자 풀꽃이 가득 덮여있다.
“아빠, 저것 보세요. 호수 주변이 온통 노랗게 물들었어요.”
“하하하, 그래, 과연 그렇구나.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인데, 벌써 저렇게 자랐구나. 봐라, 새도 깃들 정도다. 요나야, 너도 지금은 겨자씨만하지만 어서, 어서 커야지.”
아빤 요나를 물가에 데리고 가셨다. 갈릴리 호수의 물가는 온통 돌밭이다. 그래서 돌 틈 사이사이를 헤집고 숨바꼭질을 하는 꼬마 물고기들에겐 둘도 없는 천혜의 놀이터다. 장난치며 웃고 떠드는 꼬마들 탓에 물가는 물가대로 꽃이 만발해있다. 웃음꽃이다.
돌밭을 지나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얕은 곳에 틸라피아 물고기의 먹거리 장터가 있다. 물 속에서 따뜻한 물이 퐁퐁 솟아나는 샘터다. 호수 밖에서 흘러드는 찬물과 호수 밑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샘물이 마주치는 그 곳엔 틸라피아의 주식인 플랑크톤이 가득 넘쳐난다.
“암눈!”
“암눈!”
갈릴리 호수의 틸라피아들은 서로를 만날 때 “암눈”이라고 인사한다. 암눈은 ‘돌보는 물고기’란 뜻의 히브리 말이다. 틸라피아는 알로 태어나자마자 치어가 될 때까지 엄마가 입 속에서 돌본다. 입 속에 알을 품고 있을 때 엄마는 알에게“암눈” 하며 인사한다.
암눈은 태교의 언어인 셈이다. 암눈의 인사를 들으며 틸라피아는 알에서부터 누군가를 돌보는 삶을 성품으로 익혀간다. 그래서 암눈은 틸라피아의 천성이고 또 숙명이 된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일 큰 놈은 누구일까? 단연 메기다. 메기가 가장 두렵고 사나운 포식자다. 그 다음 덩치는 잉어인데 그 역시 포식자다. 틸라피아도 큰 편에 속하긴 하지만 이웃을 해할 일은 없다. 플랑크톤만 먹으므로 육지로 치면 초식동물 같다.
갈릴리의 틸라피아는 평화를 사랑한다. 빗처럼 생긴 등지느러미를 가지런히 세우고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틸라피아를 보고 있노라면, 치고 박는 싸움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고고한 선비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평화주의자 틸라피아에게도 언제나 적이 도사리고 있다. 갈릴리 호수 역시 어김없는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포의 깡패두목 메기는 언제나 공포의 대상이다. 길이가 1미터를 넘는 놈도 있다. 메기는 자신 보다 몸이 작은 수중생물은 무엇이든 잡아먹는 가증스런 포식자다. 호수 밑바닥의 바위나 돌 틈에 주로 살면서 야행성으로 움직인다.
입가에 달린 네 개의 수염으로 바닥을 훑고 다니며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사냥한다.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선언한 비늘 없는 물고기, 메기! 바로 그 놈이 틸라피아의 평화를 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