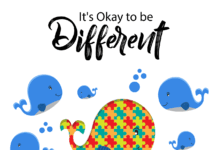“에구~, 뭐가 이리 많은지 필요한 것만 남겨 놓고
이제 좀 버리고 살아야겠어요. 여기저기 넘 많아요.”
신발장을 열어 봐도 신발 가득,
옷장을 열어 봐도 옷이 가득,
부엌 찬장을 열어 봐도 그릇이 가득,
수건 캐비넷을 열어 봐도 수건이 가득,
여기저기 열어 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건
뭐니뭐니해도 머니가 아니라 책입니다.
아래층에도 가득,
이층에도 가득,
방마다 가득,
이제는 거실까지 한 벽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남 주자니 그렇고,
다 가지고 있자니 욕심이 넘쳐나는 것 같아
마음은 늘 버리고 살자 합니다.
어느 날, 맘먹고 버렸다가
이 옷은 얇아서 여름에 시원해서 안되고,
이 옷은 두꺼워서 겨울에 한번 더 입어야 하고,
이 그릇은 멀쩡하니 좀 더 쓰고 버리고,
이 수건은 빨았으니 한번 더 쓰고 버리지 뭐.
밖에 버렸던 물건 주섬주섬 다시 들고 들어와
또 한가득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못 버리는 것이 책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 더 못 버리는 것이 큐티 책입니다.
몇 년이 지난 책인데도 다시 찾아볼 일이 있을 거 같아
연도 별로 주욱~ 꽂아 놓고 한번도 안봅니다.
어느 날, 문득 버려야겠다고 책장에서 다 뽑아 놓고는
“말씀이 기록된 이 귀한 큐티 책을 버릴 순 없지!”
다시 제 자리에 꽂아 놓고 눈으로만 만족해 합니다.
버리자, 버리자!
비우자, 비우자!
늘 마음 속 구호로만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 두 명이 들어도 들기 어려운 물건이 하나 집에 들어 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큰소리로
“버리고 살자! 비우고 살자! 없애고 살자!”
외치던 남편이 중고 러닝머신을 착한 가격에 가져 온 겁니다.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 밖에 안 하는 사람이 러닝 머신을 들여 오길래 상당한 기대를 했지요.
“아~, 저렇게라도 운동을 하려나 보네”
하루이틀사흘……
웅장한 모습으로 러닝머신을 거실 한 쪽에 모셔 놓고 그 옆자리에 앉아 책만 봅니다.
“보고만 있으면 저절로 운동이 되고, 살이 빠지나? 왜 갖다 놓고 한번도 뛰진 않아요?”
아이들도 아내도 궁시렁궁시렁 투박을 줘도 절대 뛰지 않던 남편이 어쩔 수 없는 성화에 못 이겨
하루는 맘먹고 러닝머신에 올라갑니다.
모두가 신기한 듯 쳐다보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곰 한마리가 쿵쾅쿵쾅 달려오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절대 남편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얘야, 천천히 걸어라, 배 꺼질라”
배고픈 시절에 밥 먹고 아이들이 뛰어 놀면 어른들이 말씀 하셨다지요.
“여보, 천천히 걸어요. 살 빠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할 판입니다.
걷는 그 소리가 하도 웅장(?)해서 소음 공해를 일으킬까 해서요.
그래서 남편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뱃살을 고이 간직하고 있답니다.
“버리자! 비우자! 없애자!”
구호가 아닌
정말로 내가 버리고, 비우고, 없애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내 자신부터 좀 돌아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