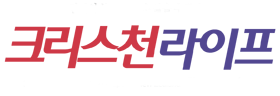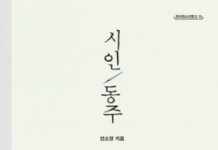4월 둘째주 찬송/3장,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송영은 가장 오래된 초대교회 찬송 송영 ‘성부 성자와 성령’(Gloria Patri)은 AD 2세기 작품으로 성경 시대 이후 가장 오래된 찬송이다. 송영을 영어로 독소로지(Doxology)라 하는데, 고대 그리스어 독사(δόξα, doxa, ‘영광’)와 로지아(λογία, logia, ‘말씀’)의 합성어로 이 전통은 유대교 회당에서 행해지던 관습이다(대상 16:36, 시 41:13, 72:19, 89:52, 106:48).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대상 16:3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시 41:13)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시 72:19)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시 89:52)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시 106:48)
이같은 송영(“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은 신약성경에도 많이 나타난다(롬 11:36, 16:27, 갈 1:5, 엡 3:21, 딤전 1:17, 딤후 4:18, 히 13:21, 벧전 4:11, 5:11, 벧후 3:18, 유 25, 계 1:6, 4:11, 5:13, 7:12).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롬 11:36)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롬 16:27)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갈 1:5)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엡 3:21b)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딤전 1:17)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 1:6).
아직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기 전인 AD 2C ‘디다케’(Didache)의 성만찬 예전 기도나 폴리캅의 순교 서신에 “성자”와 “성령”이 추가된 영광송이 나타나며, 오리게네스(c.185-c.253)의 저서인 ‘기도에 대하여’(‘Peri Euches’) 마지막 부분의 가르침에서 비로소 전형적인 라틴어 영광송의 틀이 형성되었다.
송영은 전통적으로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후렴처럼 불렀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선 성시교독 직전이나 직후에 이 송영을 부른다. 또한 예배를 시작할 때나 마칠 때 부르기도 하며, 찬양의 마지막 절에 부르기도 했다. 가톨릭교회에선 시간 전례, 성찬 기도, 성무 일과, 묵주기도 때에도 부른다.
우리 찬송가 ‘찬양 성부 성자 성령’(2장), ‘성부 성자와 성령’(7장)도 곡조와 가사는 조금씩 다르나 영광송(Gloria Patri)이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2장, 4장)
“Gloria Patri, et Filio, et Spiritui Sancto,
Sicut erat in principio, et nunc, et semper,
et in sæcula sæculorum. Amen.”(가톨릭교회 라틴어 전례문)
4월 넷째주 찬송/통103장 참 목자 우리 주
초대교회의 언어인 헬라어 찬송
“때가 차매”(갈 4:4)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시대를 가리켜 흔히 그레코-로만(Greco-Roman: 그리스 양식과 로마 양식을 혼합한 예술 양식. 특히 그리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로마식) 시대라 하는데 예수 시대부터 그레고리우스 1세가 등장한 AD 590년까지 초대교회 시대로 구분한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BC 356-323)의 세계 정복은 하나의 언어인 헬라어로, 문화로 주님의 때를 준비하였다. 프톨레미 2세(Ptolemy II, BC 285-247) 때 구약성경 70인 역(Septuagint, LXX) 헬라어 번역판이 나왔으며, 이 칠십인 역은 드디어 초대교회의 성경이 되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란 말이 있듯 로마 제국은 바다와 육지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도로망으로 주님의 때를 예비하였다. 사도들은 그 도로를 밟으며 그 언어(헬라어)로 복음을 전했다. 초대교회의 구심점이었던 교회는 로마교회를 제외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모두 동쪽 지역이다. 사도들은 이곳을 두루 다니며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고, 헬라어로 편지를 썼으며, 헬라어로 찬송도 지어 불렀다. 신약성경이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쓰인 이유이다.
찬송 시 ‘참 목자 우리 주’(“Shepherd of eager youth”)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c.150-c.220)가 헬라어로 쓴 저서 ‘교사’(‘Paedagogus’) 중 마지막 부분이다. ‘헬라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알렉산드리아 신학교 교장이었다. 그는 그리스의 철학적 전통들을 기독교 교리와 결합하였고, 헬라 시의 운율형식을 빌려 신학을 접목한 찬송 시를 지었다.
“참 목자 우리 주 사랑과 진리로 이끄시니
승리 왕 우리 주 그 이름 기리며
성도들 모여 와 찬양하라”(통 103장, 1절)
헬라어 찬송 시는 크레테의 앤드류(Andrew of Crete, 660-732)가 지은 ‘믿는 자여 보라’(‘Christian, dost thou see them’, 개편 347장), 다마스쿠스의 요한(c. 675-c. 754)이 지은 ‘주 부활하신 날’(‘The day of resurrection’, 개편 138장)과 ‘주 예수의 부활’(‘Come, ye faithful, raise the strain’, 개편 140장)이 우리 찬송가에 실렸다.
21C 새 찬송가에는 그리스 정교회 예전(Greek Liturgy)에서 나온 곡조 ‘아멘’(640장) 한 장만 실려있다.
“믿는 자여 보라 우리 선 땅에
어둠 권세 두루 밀려오나니
믿는 자여 함께 깨어 일어나
주의 능력 얻어 싸워 이기라”(개 347장, 1절)
“주 부활하신 날에 그 소식 퍼지니
뭇 제자 너무 기뻐 곧 뛰어갔도다
그 엄한 인봉했던 돌문을 여시고
주 예수 부활하사 큰 기쁨 주셨다”(개 138, 1절)
이 글은 필자가 진행하는 유튜브‘김명엽의 찬송교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