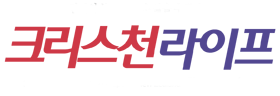2월 셋째 주 찬송/54장(통61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성전을 떠나며 주님 축복에 감사하고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찬송 시 ‘주여 복을 구하오니’(‘Lord, dismiss us with Thy blessing’)는 영국 요크셔 브래드포드 부근 리젯 그린 태생인 포셋(John Fawcett, 1740-1817) 목사가 지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12세에 고아가 되었고, 13세에 브래드포드에 있는 양복점 견습생으로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16세에 조지 휫필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영접한 후 침례교 목사가 되어 웨인스게이트와 북부 잉글랜드의 헵덴 브리지 근처 작고 가난한 두 교회에서 7년을 사역하던 중 런던의 큰 교회(Carters Lane Baptist Church)의 부름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평생 가난한 교회를 섬겼습니다(이때 지은 찬송이 221장 “주 믿는 형제들”입니다). 포셋 목사는 수필, 설교, 논평, 기타 종교 저작물과 많은 찬송가를 저술하였고, 브라운 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찬송 시는 1773년 잉글랜드 슈루즈베리에서 출판된 찬송가(‘Shawbury Hymnbook’) 부록에 익명으로 처음 실렸으며, 1791년 잉글랜드 요크에서 출판된 찬송가(‘John Harris Collection of Psalms and Hymns’) 제7판부터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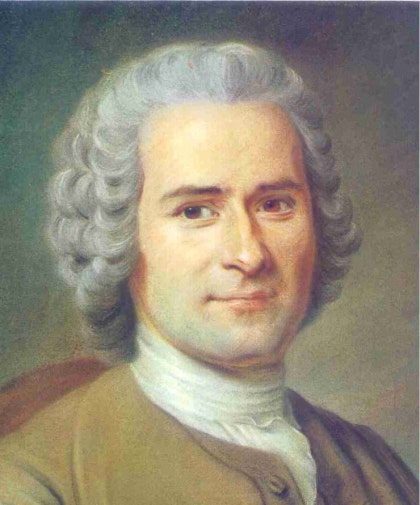
곡명 GREENVILLE은 스위스 제네바의 철학자이자 작곡가인 룻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가 1752년에 작곡한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Le Devin du Village’)에 나오는 멜로디입니다. 이탈리아 민요인 곡명 SICILIAN MARINERS로도 많이 불립니다.
1절은 회중들이 교회를 떠나며 주님께서 기쁨과 평안의 축복을 내려 주시길 빕니다(민 6:24, 엡 2:4-7, 시 63:1-2).
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기를 빕니다(골 3:16-17, 갈 5:22-23, 마 25:21, 고전 4:2).
트링(Godfrey Thring) 목사는 1880년에 종말론적인 3절을 지어 덧붙였습니다. “구세주여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두려움에 떨지 않고 순종하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소망을 기대합니다(창 3:19, 전 12:7, 히 13:14, 계 22:1-5).
2월 넷째 주 찬송/6장(통8장) 목소리 높여서
로켓처럼 하늘 솟는 찬양 외침에 지구본 쓰다듬듯 한 주님의 손길
찬송 시 ‘목소리 높여서’(‘Now to the King of heav’n’)는 아이작 왓츠(Isaac Watts, 1674-) 목사가 지은 시를 도드리지(Philip Doddridge, 1702-1751) 목사가 개작한 것입니다. 왓츠 목사가 사역하던 18세기 초 영국 교회의 성도들은 시편가(Psalter)만을 불렀습니다. 시편가란 제네바에서 칼뱅이 창안한 것으로, 구약의 시편 전체를 곡조에 붙여 노래할 수 있도록 운율화한 것입니다.
비국교도 목사인 왓츠는 운율로 된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부르게 한 칼뱅의 찬송 규범에 시편도 복음적인 해석으로 시대에 맞게 노래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찬송 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주일 예배 때마다 설교에 적합한 찬송 시를 지어 교인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도드리지 목사는 왓츠 목사에게 영향받은 찬송 작가 중 한 사람입니다.
찬송 시는 왓츠가 1719년에 지었습니다. 아들뻘의 도드리지는 왓츠가 지은 찬송 시의 후반(“만입이 노래하리라/ 그 이름 영원 무궁히”)을 1755년에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로 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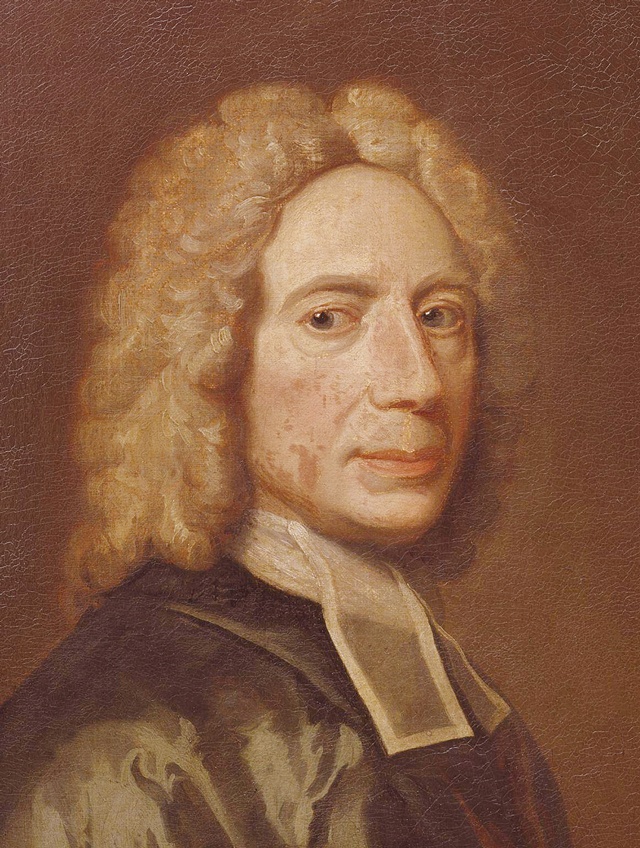
곡명 ST. JOHN은 1851년 영국에서 출판된 성가곡집(The Parish Choir, Vol.3)에 왓츠의 찬송 시에 붙여 작곡자 미상으로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887년에 발간된 찬송가(‘Hymns of the Faith’, p.282)에는 하버갈(William Henry Havergal, 1793-1870) 작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1894년에 출판된 찬송가(‘Evangel Songs’, p.3)에는 또 다른 출처(‘Weigh House Chapel Coll.’), 1897년에 출판된 캐나다 찬송가(‘The Presbyterian Book of Praise’, p.694)는 옛 영국 민요(‘Old English Melody’) 등등 찬송가마다 다양한 출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송영(doxology)으로 분류됩니다. 송영은 유대교 회당의 관습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을 찬양하는 짧은 찬송으로서 시편 교독의 전후에 부르거나 찬송가의 끝에 추가되기도 합니다.
‘도미미솔솔도’로 조약 진행하는 “목소리 높여서”의 처음 음형은 찬양의 외침이 로켓처럼 하늘 높이 솟습니다. 그리고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순차진행은 지구본을 어루만지듯 온 누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같습니다(딤전 1:17).
이 글은 필자가 진행하는 유튜브‘김명엽의 찬송교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