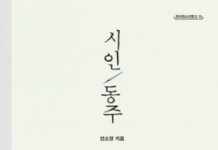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다. 단 칼이면 끝낼 수 있다. 두 번 휘두를 필요도 없다. 자루를 쥔 손목에 힘을 주어 지긋이 밀어 넣기만 하면… 그렇게만 하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도 끝이다.
잃어버린 시간과 경력. 그 동안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며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던가? 게다가 가족들은 또 어떠한가? 나 때문에 ‘반란 음모 가담 죄’라는 낙인이 찍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나?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광야에서 식솔들을 책임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사 백여 명의 안전과 먹거리를 책임지는 일. 그저 버텨낸 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풀리지 않는 마음의 의문들이었다. ‘내가 정말 무슨 그리 대단한 잘못을 한 것일까?’
수천 번을 자문하고 또 자문해봤지만 나는 정말 모르겠다. 내가 왕께 무슨 그리 큰 죄를 지었는지. 어쩌면 이 모습이 잘못된 걸까?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런 내 모습이? 차라리 누군가 속 시원히 대답해 줬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때 이런 죄를 지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왕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다. 그를 이해해 보려고 몸부림쳐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이해 밖에서 사고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냥 처음부터 나서지 말았어야 했을 것을. 그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지 않았더라면 그냥 다른 사람처럼 침묵하고 있었더라면 왕의 눈에 뜨일 일도 없었을 테고 업적을 세울 기회도 없었을 텐데. 그랬다면 왕의 질투를 살 일도 없었을 것 아닌가?
질문의 질문을 거듭할수록 질문은 풀리지 않는다. 하지만 질문하지 않고선 또 살 수 없다. 그것이 나의 딜레마. 이 딜레마를 풀어줄 존재는 이 땅에 어디에도 없으니, 오직 하늘에 계신 이만이 해답을 가지고 계시리라.
그런데 오늘!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사울이 내 눈앞에서 잠들어 있다. 마치 누군가 물어다 준 먹잇감 마냥. 이 자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지칠 만큼 되묻던 질문의 답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이 ‘칼’ 이면 된다. 아비새 말처럼 두 번 휘두를 필요도 없다. 단칼에 끝낼 수 있다. 그저 칼자루를 쥔 손목에 힘을 주어 지긋이 밀어 넣기만 하면. 그렇게만 하면. 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사무엘상 26:9)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사울이 그를 또 추격해왔다. 삼천의 대군을 이끌고 십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지를 구축했다. 사울 왕의 숙소는 진지의 정 중앙에 위치해 있었는데 호위병과 군사들로 둘러싸여 있어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밤,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왕의 숙소로 접근하는데 성공한다. 모두가 곤히 잠들어 있었고 왕 또한 잠들어 있었다. 사울이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그 순간 아비새가 다윗을 부추겼다.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자신이 직접 사울을 죽이겠노라고.
모든 것을 단번에 회복 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 합리적 이유로 부추기는 동료. 하지만 다윗의 선택은 달랐다. 그가 선택하는 방식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는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 즉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손해’였으며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미련한’ 선택이었다.
성경은 담담히 결론을 말해준다. 다윗이 아비새를 저지하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온 것으로. 하지만 나의 예술가적 상상력은 이 단순한 저술에 약간의 조미료를 첨가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다윗은 정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사울의 창과 물병만 들고 즉시 자리를 떠났을까? 0.1초의 고민도 없이?
다윗은 존경 받을 만한 인물이었지만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다. 그의 일생 동안 보여진 인간적 면모들을 근거 삼아 볼 때, 위 상황 속에서 아주 잠깐의 망설임, 혹은 약간의 머뭇거림 정도는 있을 법하지 않았을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지 않는 것은 너무 위험한가? 하지만 이런 멋진 소재를 그냥 넘기기에는 아쉽지 않은가? 상상해 보는 게 죄는 아니니 모두 예술가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길.
‘만약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고민을 했을까?’ 라고. (위의 그림은 그런 상상을 ‘극화(dramatize)’ 시켜 표현해 본 것이다.)
사무엘상 26장 8절과 9절 사이의 여백을 나의 고백으로 채워본다면 성경을 더 가슴 깊이 와 닿는 책으로 읽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무관한 수 천년 전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히고 덮이기에 성경은 이런 재미있는 소재들로 가득하다. 물론 결론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혹시나 나의 이런 시도가 불편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글과 그림을 너그럽게 덮고 넘어가 주시길. 누군가를 불편케 하려고 창작하는 건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