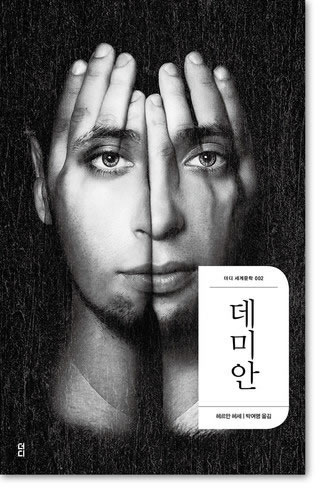우연히 수업 도중에 그 쪽지가 내 손에 쥐어졌다. 그 종이를 만지작거리다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펴 보았다. 거기에는 몇 마디의 짧은 문장이 씌어 있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데미안의 답장이었다.”
데미안(Demian)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19년에 독일의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가 발표한 소설이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에밀 싱클레어(Emil Sinclair)는 아버지의 세계에서 자랐다. 아버지의 세계는 가부장적 양육과 기독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계였다. 인생이 아름답고 정돈되어 있으려면 그 세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싱클레어의 유복한 삶은 불량소년 프란츠 크로머(Franz Kromer)로 인해 파괴되고 만다. 크로머에게서 싱클레어를 구해준 건 새로 전학 온 막스 데미안(Max Demian)이었다. 데미안은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크로머를 단번에 정리해주었다.
데미안은 특이했다. 가인과 아벨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싱클레어를 혼란에 빠트리기도 했다. 즉, 아벨을 죽인 가인이 이마에 표적을 받은 것은 강자로서 신에게 표창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식이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싱클레어는 아버지의 세계에서 독립해 자신의 내면을 찾아 나선답시고 술과 향락에 쩔어 살았다. 싱클레어는 그가 짝사랑한 베아트리체(Beatrice)라는 여성에게서 데미안을 느꼈다.
어느 날 싱클레어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은 마치 큰 알을 깨고 나오려는 매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그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냈는데, 데미안으로부터 온 답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새는 알을 뚫고 나오기 위해 싸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Abraxas)다.”
싱클레어는 오르가니스트 피스토리우스(Pistorius)를 만나 아프락사스를 더 알아간다. 피스토리우스는 신학도 출신이지만 신앙을 잃은 자였다. 그는 싱클레어에게 “난 겟세마네의 예수처럼 완전히 벌거벗고 고독하게 서 있을 수가 없었네.”라고 고백했다.
싱클레어는 대학에 진학한 후 우연히 데미안과 만나게 된다. 그의 집으로 가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Frau Eva)을 만난다. 싱클레어는 에바부인에게서 이성애를 느낀다. 에바 부인은 그가 꿈 속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프락사스의 얼굴이었다.
마침내 독일과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한다. 데미안이 먼저 소위로 전쟁에 참전하고 싱클레어도 뒤이어 참전한다. 전쟁터에서 싱클레어는 알에서 뛰쳐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새를 본다. 알이 세계였으므로, 세계는 파괴되어야만 했다.
어느 날 싱클레어가 폭격을 받고 정신을 잃어 임시병동에 수용되었다. 그의 옆에 데미안이 있었는데, 다시 깨고 보니 데미안이 없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모습이 데미안의 모습과 겹쳐 보임을 깨닫는다.
이렇게 끝나는 ‘데미안’은 줄거리만으로도 쉽게 느낄 수 있겠지만, 종교적 색채가 무척 짙은 소설이다. 특별히 기독교, 그 중에서도 절대 선의 하나님과 선악의 이분법에 강하게 반발한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밝은 세계만의 반쪽 신이라고 비난한다.
클레어는 대학에 진학한 후 우연히 데미안과 만나게 된다. 그의 집으로 가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Frau Eva)을 만난다. 싱클레어는 에바부인에게서 이성애를 느낀다. 에바 부인은 그가 꿈 속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프락사스의 얼굴이었다.
마침내 독일과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한다. 데미안이 먼저 소위로 전쟁에 참전하고 싱클레어도 뒤이어 참전한다. 전쟁터에서 싱클레어는 알에서 뛰쳐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새를 본다. 알이 세계였으므로, 세계는 파괴되어야만 했다.
어느 날 싱클레어가 폭격을 받고 정신을 잃어 임시병동에 수용되었다. 그의 옆에 데미안이 있었는데, 다시 깨고 보니 데미안이 없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모습이 데미안의 모습과 겹쳐 보임을 깨닫는다.
이렇게 끝나는 ‘데미안’은 줄거리만으로도 쉽게 느낄 수 있겠지만, 종교적 색채가 무척 짙은 소설이다. 특별히 기독교, 그 중에서도 절대 선의 하나님과 선악의 이분법에 강하게 반발한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밝은 세계만의 반쪽 신이라고 비난한다.
소설 ‘데미안’이 추구하는 신적 대안은 아프락사스다. 아프락사스는 선과 악을 결합한, 악마이기도 한 신이다.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달리,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모두를 포용한다. 내면의 악한 본성조차 용기있게 표출할 때 우리의 자아가 껍질을 깨고 성장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저 유명한 ‘데미안’의 인용문이다.
“새는 알을 뚫고 나오기 위해 싸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Abraxas)이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의 서문에서 이렇게 썼다. “난 진정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그것을 살아보려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아프락사스 추종자들은 선이든 악이든, 자신의 영혼에서 솟아 나오려 할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라고 말한다. 성적인 욕망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있어 “저마다의 삶은 자아를 향해 가는 길”(데미안 서문)이다. 그들은 인간 내면의 악을 죄로 규정한 성경의 율법을 새가 깨고 나와야 할 알의 껍질에 등치하였다.
이처럼 ‘데미안’은 신을 차용한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하다. 기독교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데미안’을 비평할 기준은 역설적으로 성경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요한복음 1:1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은즉, 성경 스스로 진리의 권위를 자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묵상컨대, ‘데미안’의 아프락사스는 창세기 3장의 사탄에 다름 아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으며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 그때 사탄이 무엇이라고 말했던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그렇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으로 인해 빠져들었던 타락의 길은 곧 선악을 결합한 신적 존재, 아프락사스의 길이었다.
많은 서평에 의하면, ‘데미안’은 1차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의 청년들에게 자아회복의 새로운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고 한다. 당시 독일의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토마스 만(Thomas Mann)은 이를 두고 “젊은 세대가 고마움의 열광에 휩싸였다”고 표현했다. 필자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데미안’에서 1차대전은 세계가 알을 깨는 과정으로 미화된다.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전쟁을 통해 발산되어‘새로운 인류’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런 관점이라면, 독일청년들이 전범국 국민의 열패감에서 벗어나 새 희망을 품을 법 하지 않은가.
그러나 오늘날 독자들은 이 대목에서 혼란을 겪는다. 1차대전이 새가 알을 깨는 과정이라면, 아프락사스는 인류를 전쟁의 파멸로 몰아넣은 악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1차대전 당시의 독일청년들이 장년으로 성장해 2차대전의 또 다른 전범이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아프락사스가 뭐라고 속삭였을지 사뭇 궁금하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반전주의자로 알려진 헤르만 헤세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의 시인 이상은 그의 단편 ‘날개’를 이렇게 마무리한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날개’의 주인공은 ‘박제가 되어 버린 천재’였다. 완전히 속박된 채 주체적 삶이 없는 신세였다. 그런 그가 날개가 돋아나 다시 날기를 원했다.
우리도 날아야 한다. 그러나 날되, 참 정체성을 찾는 일이 우선이다. 독수리가 어찌 참새로 날 수 있으랴. 우린 악한 본성을 벗지 못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십자가 예수에 연합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의로운 자아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아프락사스가 필요없다. 아프락사스는 구원의 이름이 아니다. 1차 대전이 그랬듯, 아프락사스의 끝은 인류의 절망일 뿐이다. 하나님은 예수 외에,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사도행전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