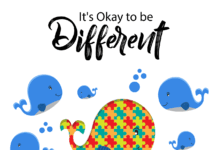“엄마, 나 배 아파서 죽을 거 같아요. 못 참겠어요.”
택시 뒷자리에 앉아 있던 딸아이가 다 죽어가는 소리로 배를 움켜 잡고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화장실 가야 되는 거 아니니? ”
“화장실 갈 배가 아닌거 같아요. 나 죽을 거 같아.”
야단이 났습니다. 그냥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창자가 꼬이고 창자가 터지게 아프다는 딸아이를 보니 다리도 못 펴고, 배는 부둥켜 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병원 가야 할 거 같으니?”
멀쩡히 잘 있다가 왜 갑자기 배가 아픈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아픔은 잘 견디는 아이인데 병원으로 가자고 합니다.
택시기사도 심상치 않은지 가까운 병원으로 급히 차를 돌립니다. 저녁 퇴근시간인지라 길은 막혀있고, 아이는 아프다고 저렇게 절절매며 금방 죽을 거 같고…
오, 주여! 아이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손에도 흥건히 땀이 고여있습니다.
“기사님, 최대한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가주세요.”
가까스로 십 여분 만에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 두 명이 휠체어에 딸아이를 태워 급히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남편과 아들도 뒤따라 달려 갑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소리 외에는 더 할말이 없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의사가 이것저것 묻고, 여기저기 눌러보더니 피검사부터 하자고 합니다. 여전히 딸아이는 배를 움켜잡고 있습니다. 의사가 간 사이 아이에게 살짝 물었습니다.
“혹시 똥배 아니니? 똥누고 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엄마는 내가 지금 똥배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는 줄 알아요?”
간호사가 피를 뽑아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배아파하던 딸아이가 조심스레 말을 합니다.
“엄마, 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화장실에 들어 간 아이는 한참을 지나도 안나오고, 의사는 애 찾으러 왔다갔다 하고…
한참을 지나 화장실에서 나온 딸아이가 내 귀에 대고 조용히 말을 합니다.
“엄마, 설사했어, 많~이! 이제 배가 안아파!”
“오, 마이 갓!”
아프던 배가 멀쩡해져서 넘 감사하고 다행이지만 휠체어까지 타고 죽을 둥 살 둥 달려들어온 응급실에서 설사 한방에 아프던 배가 치료(?) 되었으니 뭐라 해야 할까요?
“저어~, 얘 이제 배 안아프데요. 화장실 갔다오더니…”
“네에?”
나보다 더 놀라는 의사 앞에 쥐죽어가는 소리로
“저희들 그냥 집에 갈게요.”
그래도 더 검사를 해봐야 한다며 어이없어 하는 의사를 뒤로 하고 얼른 딸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듯 대기실로 나오니 남편과 아들과 놀라서 달려온 삼촌까지 세 남자가 눈이 휘둥그레 쳐다봅니다.
“얘가… 화장실에 가서…설사하고 나더니…괜찮데”
그 날, 화장실 한번 사용하고 5만8천원 물고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한국에 왔다가 이것저것 뒤섞어 먹은 한국음식에 배가 놀랐는지 배탈이 된통 났었나 봅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입니까?
다 쏟아내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고 그 아프던 배가 말끔히 나았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할 수 밖에요.
2017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일년 동안 이것저것 집어삼킨 것으로 배를 부글부글 아프게 하고, 창자가 뒤틀려 끊어질듯 진땀나게 나를 아프게 한 것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짜증… 분노… 화… 무력감…절망…
불평… 불만… 불만족… 불신앙…
열받아 뚜껑이 열리게 하는 모든 나쁜 것들…
분별없이 집어삼킨 모든 나쁜 감정들…
잠 못 이루게 몹시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
그래도 우리…
무지무지 아프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 다 섞어 시원하게 몽땅 쏟아내고 올 한해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해보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