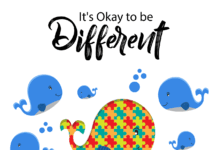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은 비단 나이든 사람들뿐만은 아닐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때때로 지나간 삶을 되돌아본다. 특히 해가 바뀔 때는 지나가버린 한 해를 아쉬워하며 지난 시간 속에 일어났던 어떤 일은 잊고 싶어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그리워하며 안타까운 한숨을 쉬기도 한다.
지난해는 내 개인에게도, 그리고 삼십 년이 넘는 오랜 이민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살고 있는 내 고국에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이 생긴 한 해였다. 그래서였는지 지난해엔 연말이 되면서부터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詩)가 있었다. 까마득한 옛날 학창 시절에 즐겨 읽던 프랑스 시인 라마르틴(Alphonse de Lamartine)의 ‘호수(Le lac)’라는 시였는데 그 첫 연이 슬프도록 아름답다.
이렇게 항상 새로운 기슭으로 밀리며,
영원한 밤속으로 되돌아옴이 없이 실려가며,
우리 단 하루만이라도 이 세월의 대양에
닻을 던질 수는 없을까?
낭만파(浪漫派) 시인이었던 라마르틴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지는 이 시는 건강이 나빠진 시인이 휴양하기 위해 알프스 산록의 휴양지 엑스-레-방에 있는 부르제 호반(湖畔)에 갔다가 그곳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졌던 쥴리 샤를르(Julie Charles)라는 연상의 부인을 그리워하며 쓴 시다. 부인도 시인과 마찬가지로 휴양을 위해 그곳에 왔고 둘 다 몸은 아팠지만 만나면서 몽상적(夢想的)인 사랑에 빠져 한동안을 지내다가 겨울이 되자 1년 후에 다시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1년 후 시인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다시 그곳 호숫가에 돌아와 기다렸지만 그사이 병이 악화돼 세상을 떠난 그녀는 나타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시가 ‘호수’였고 이 시는 당시의 프랑스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시인의 진실하고 아름다운 슬픔이 모두의 가슴을 울렸기 때문이었다.
단 하루만이라도 세월의 대양에 닻을 던질 수는 없을까?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리웠으면 ‘우리 단 하루만이라도 이 세월의 대양에 닻을 던질 수는 없을까?’라고 절규하였을까? 아무도 지나가는 세월을 멈출 수도 없고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도 없다. 그걸 모르지 않는 시인이지만 그녀와 같이 지냈던 그 세월이 너무도 그리워 시인은 ‘단 하루만이라도 세월의 대양에 닻을 던져 멈추게 할 수 없느냐’고 부르짖는다.
시인의 애절한 마음에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그렇게도 간절히 그리워할 수 있었던 시인의 마음에서 진실한 삶의 단편을 보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훈훈해지기도 한다.
해가 바뀌고 또 한 달이 지나 2026년의 2월의 문턱을 넘은 지금, 시간을 내서 이제껏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흐르는 강물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지난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무언가 사무치도록 그리운 것이 있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라도 하나 이상의 그리움은 알게 모르게 평생 품고 살았을 것이다. 영원히 잊었던 줄 알았던 그리움이 기억의 실핏줄을 타고 흘러나와, 가슴을 적시면 사무침이 살아날 것이다.
사무침에 마음을 맡기고 회상에 잠기다 보면 어느덧 시간의 흐름에 역류하고 싶은, 아니 그것이 안되면 그 그리움의 순간을 멈추어 놓고 다시 그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 그리움의 대상이 무엇이든 그렇게 그리웠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사무치면 우리도 ‘호수’의 시인처럼 ‘단 하루만이라도 세월의 대양에 닻을 던질 수는 없을까?’라고 신음처럼 소리칠 것이다.
이렇게 항상 새로운 기슭으로 밀리며
시간은 공평해서 누구에게나 하루하루가 지나면 달이 되고 달이 몇 번 지나면 해가 바뀐다. 해가 바뀌면 사람들은 무언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지난해와 다른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환경을 붙잡는 일이 아닐까 한다. 지난 세월의 그리움과 회한은 가슴 속으로 깊숙이 넣어 놓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직시하며 새로운 삶을 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해가 바뀌었다 해도 지나간 다른 해들과 마찬가지가 되고 내 삶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 시(詩)의 첫머리에서 시인은 ‘이렇게 항상 새로운 기슭으로 밀리며’라고 읊었다. 바뀐 새해를 제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새해라는 이름의 ‘새로운 기슭으로 밀려가는 것’이라고 시인이 탄식하는 것이다. 모두가 살기 힘들다고 신음하는 요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여기’의 환경을 제대로 살펴보면 어떻게든 타개해 나갈 길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NOWHERE’란 단어의 해석 방법이 생각나 여기에 소개한다. ‘NOWHERE’는 보는 관점 또는 띄어쓰기에 따라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 ‘NO WHERE’라고 읽으면 ‘어디에도 없다’가 되고 ‘NOW HERE’라고 읽으면 ‘지금 여기’가 된다. 그렇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도 보는 관점에 따라 ‘NO WHERE’도 될 수 있고 ‘NOW HERE’가 될 수도 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2026년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누구는 ‘어디에도 없다’며 전과 같이 그냥 ‘새로운 기슭으로 밀리는’ 해가 되겠고, 누구는 ‘지금 여기’라며 ‘새로운 삶을 사는 변화의 해’가 될 것이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였느니라!
작년은 필자에게 너무도 큰 아픔과 시련을 가져다준 한 해였다. 여름이 끝나가는 8월 말에 허리가 결린다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돌연 폐암 판정을 받았던 그 순간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순간이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 왜지요?”라는 원망의 힐난이 새어 나왔다. 반백 년 삶을 같이 해온 아내는 바른 믿음과 선한 마음과 행동의 여인이었다. 그런 아내에게 평안하고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주시기는커녕 암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무척 실망하고 힘들어 했지만, 본격적인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아내는 다시 평소와 다름없이 기도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옆에서 걱정스레 지켜보는 나를 오히려 위로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욥기 1:21)을 저는 믿어요. 더 큰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번 시련을 주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해요,”라고 말하는 아내의 눈동자에서 나는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그때까지 내 마음속을 사로잡았던 ‘NO WHERE’가 ‘NOW HERE’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의외로 심해서 처음 얼마간 아내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아내의 기분 전환을 위해 아내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날에는 차에 태우고 밖으로 나와 한적한 곳을 찾아 달렸다. 작년 11월의 어느 날 오후엔 달리다 보니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금광호수에 도달했다. 호숫가로 산책로가 잘 조성된 아름다운 호수였다. 청록파 시인 박두진 선생이 그곳에서 태어나셨기에 호숫가의 길이 ‘박두진 문학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자 호수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늦가을 햇살이 잔잔한 호수면 위에서 빛나던 그날 오후, 아내가 탄 휠체어를 밀면서 ‘박두진 문학길’을 걸을 때 내게 다시 라마르틴의 시(詩) ‘호수’가 떠올랐다. 이번에는 첫 연이 아니라 마지막 구절이었다.
듣고 보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 속삭이리니
<그들은 서로 사랑하였느니라!>
그랬다,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 제대로 귀를 열어 듣고 눈을 떠서 보면 생명 있는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 병(病)마저도 사랑의 경로였다. 몸속에 숨어든 암(癌)으로 돌연 환자가 되었지만 그렇기에 아내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항암치료제와 더불어 더욱 큰 사랑과 기도로 아내를 보살필 때에 병은 완치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순간 아내의 휠체어를 미는 내 양손으로 뜨거운 힘이 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