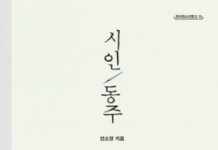“그런데 아가씨, 여러 별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별은 우리들의 별인, 우리들 목동이 양 떼를 몰고 나가는 새벽녘이나, 데리고 돌아오는 저녁때에 우리를 비춰주는‘목동의 별’입니다. 우린 이 별을 마글론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글론은 피에르 드 프로방스(토성)의 뒤를 쫓고, 그리고 칠 년째마다 피에르와 결혼한답니다.”
“어머나, 그럼 별님의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답니다, 아가씨.”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Alphonse Dodet)의 ‘별’(the Stars)은 1868년에 발표한 단편집 <풍차 방앗간에서 온 편지>에 수록되었다. 소설이라기보다 마치 한 편의 시나 연가 같다. 추하거나 선정적이지 않고 맑고 순수한 사랑의 서정이 느껴진다.
소설은 목동이 세월이 지나 회고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목동은 주인집 아가씨 스테파네트 (Stephanette)를 짝사랑한다. 그는 산에서 양을 치면서도 늘 아가씨의 소식을 궁금해한다. 누구에게라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는 20세이며, 저 스테파네트 아가씨야말로 내가 본 여성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노라고.”
목동은 산속에서 홀로 양을 친다. 2주일에 한 번씩 노라다 아줌마나 농장 꼬마가 생필품을 챙겨 올라올 때를 제외하곤 사람과의 접촉이 없다. 목동은 생필품을 받으며 마을 소식도 함께 전해 듣게 되는데, 그는 특히 남몰래 연모하는 주인집의 딸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가 가장 신난다.
어느 날 바로 그 스테파네트가 노새에 식량을 싣고 목동을 찾아온다. 농장 꼬마는 아프고 노라다 아줌마는 휴가 중이었다곤 하나, 아가씨가 자길 위해 먼 길을 찾아와줬다는 사실에 목동은 감동한다.
일을 마친 스테파네트는 산길을 내려가다 돌연 세차게 내린 소나기로 물이 불어난 개울에 빠져 할 수 없이 다시 목동에게로 올라온다.
산 속에서 지내는 밤을 무서워하는 아가씨에게 목동은 “7월의 밤은 아주 짧아요, 아가씨.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라고 안심시키며 그의 곁에 앉은 아가씨에게 하늘의 별 얘기를 들려준다. 별 얘기를 듣던 아가씨는 어느새 잠이 들어 그녀의 머리를 목동의 어깨에 기댄 채 곤히 잠이 들어버린다.
목동은 행여나 아가씨가 깰까 봐 움직이지도 못한 채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만히 생각한다.
“수많은 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려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다.”
목동은 아가씨를 사랑했다. 그 사랑은 정욕이 아니었다. 순수한 사랑이었다. 그 마음을 목동은 뒷날 이렇게 회고한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마음의 불길에 피가 타오를 듯했지만 불순한 생각은 티끌만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가 내 보호 아래 마음 편히 주무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기만 했습니다. “
이처럼 순수한 ‘별’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나라 황순원 작가의 단편소설 ‘소나기’를 생각나게 한다.
‘소나기’는 사춘기 소년소녀의 아름답고 슬픈 첫사랑을 맑고 순수한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다.
윤초시네 증손녀가 시골에 내려왔다.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년과 마주친다. 조그만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둘의 마음에 사랑이 피어난다. 둘은 소나기와 조우한다. 개울에 물이 불어나고, 소년이 등에 소녀를 업고 물을 건넌다. 둘에겐 극적인 사건이다.
소녀는 자신의 분홍색 스웨터 앞자락에 묻은 검붉은 진흙 물이 그때 소년의 등에서 옮은 물이라고 그에게 고백한다.
원래 병이 있었던 소녀는 얼마 후 죽는다. 소년은 잠깐 잠이 든 사이, 잠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를 듣게 된다. 소녀에 대한 얘기다.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가 입던 옷(소년의 등에서 옮은 검붉은 진흙 물이 묻은 분홍색 스웨터:필자 주)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여기 ‘소나기’에서 만나는 사랑은 슬프지만 소년 소녀의 동심 그대로 해맑기만 하다. 어떻게 이토록 가슴 시리도록 순수한 사랑이 이들에게 또 ‘별’의 목동에게 찾아 들었을까.
오스트리아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의 시 ‘사랑은 어떻게’가 그 신비를 노래한다.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그대를 찾아왔던가? / 빛나는 태양처럼 찾아 왔던가, 아니면 / 우수수 지는 꽃잎처럼 찾아 왔던가? / 아니면 하나의 기도처럼 찾아 왔던가? 말해다오 / 반짝이며 행복이 하늘에서 풀려 나와 / 날개를 접고 마냥 흔들리며 / 꽃처럼 피어나는 내 영혼에 커다랗게 걸려 있었더니라”
원래 사랑은 태양 같은, 꽃잎 같은, 기도 같은 것이다. 오늘날 사랑은 너무 타락되었다. 성적 욕망이 그저 이름뿐인 사랑을 뒤덮고 있다. 알퐁스 도데의 ‘별’은 황순원의 ‘소나기’처럼, 소설의 잔잔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랑에 대한 격렬한 저항의 몸짓이다.
성경을 묵상해보자. 시편 19편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선언한다.
밤하늘의 별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다. 별을 볼 때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목동은 수 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별이 스테파네트 아가씨라고 생각했다.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아무리 별이 아름답다고 한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만 있다면 사람이 가장 아름답지 않겠는가.
수년 전 필자는 주말마다 길거리 전도를 나갔었다.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행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서지만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그런 가운데 가끔씩 마주치는 믿는 자의 화답을 접하게 되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영적으로 캄캄한 이 밤하늘 같은 도시에서 그래도 이들 믿는 자의 존재가 하나님껜 보석처럼 반짝이는 별과 같겠구나.
우린 안다. 거룩한 본성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아직 우리의 성품엔 죄의 자국이 너무 많이 얼룩져있다. ‘별’은 그런 우리에게 거룩함이란 죄의 얼룩을 씻어낸 순수함과 동의어란 사실을 일깨워준다.
우리 역시 목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아가듯, 별로 상징되는 영혼의 순결함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에도 별의 서정시가 한 글자 한 글자 아로새겨지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