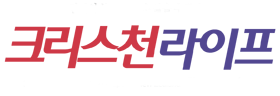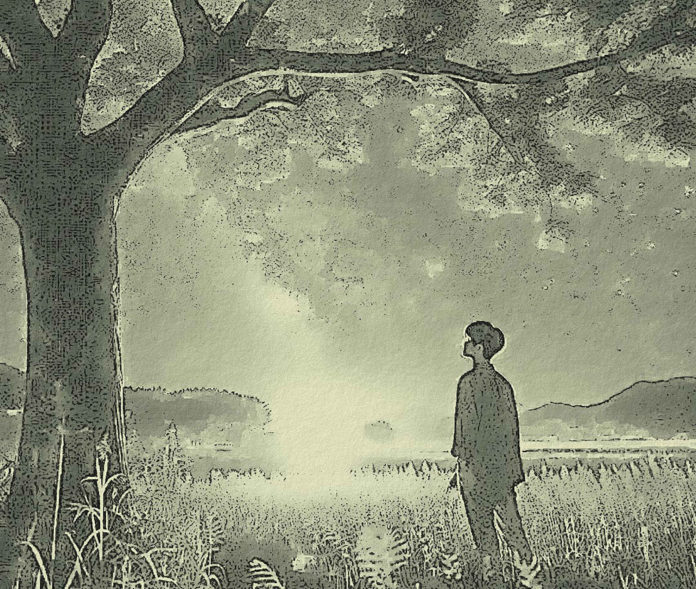서시(序詩)
윤동주(尹東柱, 1917~1945)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무시무시한 孤獨에서 죽었고나! 29歲가 되도록 시(詩)도 발표하여 본 적이 없이!” 시인 정지용(鄭芝溶, 1902~1950)이 그의 시(詩)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토해낸 말입니다.
이육사(李陸史, 1904~1944)와 더불어 민족의 저항 시인으로 대표되는 윤동주는 1945년 2월, 조국의 광복을 불과 반년 앞두고 일본에서 옥사(獄死)하였습니다.
식민지 치하에서는 단 한 편의 시도 발표하지 않은 채 29살의 젊은 나이로 죽어간 그의 일생은 해방 후 1955년 발간된 그의 유시집(遺詩集)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에 실려 있는 그의 시(詩)들만큼이나 아름답고 쓸쓸한 여운을 우리들의 가슴 속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가 쓴 시 앞에서는 어떠한 비평도 해석도 무의미해집니다. 순수한 그의 시를 읽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지 시를 쓴 시인만큼의 간곡한 심정으로 마음속에 사랑과 진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의 시는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온 정수(精髓)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인용한 그의 서시(序詩)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시인이란 부끄럼을 아는 사람
이 시를 읽으면 시인이란 누구보다도 ‘부끄럼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끄럼은 한 차례의 진통을 겪어서 고결한 아름다움으로 승화할 수 있는 부끄럼일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런 ‘부끄럼을 아는 마음’을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구절을 읽는 순간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휩쌉니다. ‘부끄럼’은 스스로의 욕(辱)됨입니다.
이 시인 이외에 과연 누가 스스로의 욕됨을 ‘잎새에 이는 바람’에서마저 느끼고 괴로워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스스로의 부끄럼을 이렇게 부끄럼 없이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자신의 부끄럼을 스스로 깨닫고 밝혀 살피기는커녕 그 부끄럼을 은폐하려고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부끄럼을 알아챈 이들을 없애버리기를 부끄럼 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이 시인의 부끄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의 구절에서 그의 부끄럼은 이미 한 차례의 진통을 겪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아름다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윤동주, 그는 부끄럼을 미학(美學)으로 발전시키고 그 미학을 시(詩)로 승화시킨 시인입니다.
그의 다른 시 ‘자화상’에서 그의 부끄럼은 처절한 자기 반성과 연민으로 나타납니다.
자화상(自畵像) _자화상 부분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앞에서 본 서시에서도 그랬지만 이 시에서도 시인의 부끄 럼은 자기를 돌아봄에서 생겨납니다. 현실이 싫어서 찾아간 도피처인 외딴 우물 속에는 시인이 꿈꾸는 모든 좋은 것들, 즉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부는 가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것들은 실상이 아니고 우물물에 비친 허상(虛像)이었습니다.
허상은 곧 사라지고 대신 한 사나이만 보입니다. 그 사나이가 자기라는 것을 안 순간 부끄러워집니다. 현실이 싫다고 찾아온 도피처가 실은 마음속의 신기루에 불과했고 그 허상을 잡아 현실로 만들 수 없는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그렇게 무기력한 스스로가 미워집니다. 그래서 우물을 떠나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런 자신의 처지가 불쌍해지고 자기 연민이 느껴져 도로 우물로 가서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곧 불쌍한 생각보다는 미운 생각이 더 커져서 다시 우물가를 벗어납니다. 돌아서 걷다가 보면 어느새 다시 그 가여운 사내가 그리워집니다.
1940년대, 일제의 압박과 학정이 더욱 심해져 가던 암흑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젊은 지식인의 마음 상태가 잘 표현된 시가 바로 이 ‘자화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싫어 도피처를 찾아가지만 그 도피처에서 발견한 것은 결국 무능한 자신의 모습이기에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부끄럼을 모르는 세대
윤동주의 시를 읽으면서 자연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대는 부끄럼을 아는 세대인가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윤동주가 살았던 때와 비교하면 오늘 우리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자유가 흘러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시인의 마음도 우물물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던 시인의 마음도 찾아보기 힘든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선 읽기도 보기도 두려운 부끄러운 사건들이 거의 매일 터져 나옵니다.
학교에선 꾸중 들었다고 학생이 선생을 구타하고 가정에선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고 정가(政街)에선 파렴치한 전과자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설칩니다. 전에는 숨어 살던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튀어나와 결혼했다고 부부의 권리를 주장하고 창조 질서를 어겨가며 성(性)을 바꾼 사람들이 자기들을 인정해 달라고 거리에서 소리칩니다. 나와 상관없으면 불의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고 또 그러라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이 대부분 ‘자유와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 자유가 참다운 자유인지, 그 인권이 참다운 인권인지 밝히기 전에 무엇보다 우리 세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끄럼을 아는 마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윤동주는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詩)에서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해 동안을 내 두뇌로서가 아니라 몸으로 일일이 헤아려 세포 사이마다 간직해 두어야 몇 줄의 글이 이루어진다,’라고 산문 ‘화원에 꽃이 핀다’에서 토로했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가 ‘부끄럼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병든 우리 세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윤동주처럼 ‘부끄럼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부끄럼’을 알아갈수록 사회는 정화되고 나라에는 병폐들이 사라져 옛 선지자 아모스의 말대로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암 5:24)’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