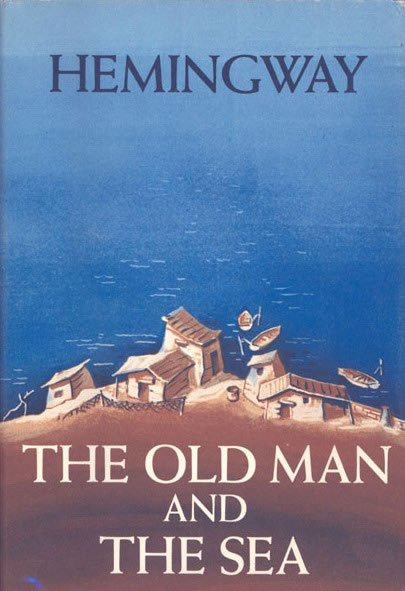“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노인은 말했다. “사람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패배하진 않아.”
산티아고(Santiago) 노인이 결연히 내뱉은 말이다. 노인은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다.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다가 85일째 되던 날, 먼 바다로 나가 마침내 커다란 청새치(marlin)를 낚았다. 그러나 너무 큰 놈이었다. 단번에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노인은 배를 끌고 도망가려는 청새치와 치열하게 싸웠다. 그러기를 물경 3일. 사투에 사투를 거듭한 끝에 노인은 배 가까이로 바싹 당겨진 청새치를 작살로 찔러 싸움을 끝낸다. 난생처음 볼 정도의 큰 물고기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청새치의 피 냄새를 맡고 상어 떼가 몰려들었다. 노인의 필사적인 저항이 무위로 돌아간다. 아귀 같은 상어의 공격에 청새치의 살점이 뚝뚝 뜯겨 나가더니 뼈만 앙상히 남았다. 허탈한 노인이 독백한다.
“좋은 일이란 오래가는 법이 없구나. 차라리 이게 한낱 꿈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고기는 잡은 적도 없고, 지금 이 순간 침대에 신문지를 깔고 혼자 누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 대목에서 산티아고 노인은 너무나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내던지며 용기를 회복한다.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사람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패배하진 않아.”(But man is not made for defeat,”he said.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우린 지금 ‘노인과 바다’(The Old Man and the Sea)를 감상하고 있다. 미국의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가 1952년에 발표한 중편소설이다.
비록 우리 인간에게 파멸이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다가올지라도 불굴의 의지로 맞서야 한다는 실존주의적 사상을 담고 있다. 다만 그 메시지를 전한 작가 헤밍웨이 자신이 이 작품을 발표한 지 9년 후 자살로 그의 인생을 끝낸 건 아이러니다.
작가의 마지막과는 달리, 그가 쓴 소설의 주인공 산티아고 노인은 바다라는 삶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희망을 버린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더구나 그건 죄악이거든.”노인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우린 나태주 시인의 ‘안개가 짙은 들’을 읽을 때, 비바람 설쳐대는 모진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희망을 꽃피우는 산티아고 노인의 기개를 잠시 엿볼 수 있다.
“안개가 짙은들 산까지 지울 수야 / 어둠이 깊은들 오는 아침까지 막을 수야 / 안개와 어둠 속을 꿰뚫는 물소리, 새소리 / 비바람 설친들 피는 꽃까지 막을 수야”
청새치와 싸우는 노인의 마음은 비장하지만 차갑지 않다. 절박한 삶의 필요가 그를 바다로 내몰았지만 그렇다고 그가 학살자로 나선 것은 아니다. 노인은 끝까지 분투한 청새치에게 형제애까지 느낀다.
자기 배가 허기질 때 청새치를 떠올리며 “물고기 녀석한테도 뭘 먹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마음으로 챙긴다.
싸우는 청새치더러 “이 녀석아, 나는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단다. 그러니까 너도 끝까지 견뎌야만 해.”라고 격려해주기도 했다.
노인은 싸우되 적대적이지 않았다. 자신은 어부로서 고기를 잡아야 하고, 청새치는 고기로서 어부로부터 도망쳐야 할 뿐이다. 그러나 상어 떼는 달랐다. 노인은 그들에게서 형제애를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약탈자요 파괴자일 뿐이었다.
우린 인생의 바다에서도 같은 교훈을 발견한다. 살아가노라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때가 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사도 바울도 그랬다. 남에겐 거침이 없던 병 고침의 은사가 정작 자신의 몸엔 통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던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 그 이후 사도 바울은 그 불치의 질병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맞선 상대가 약탈자요 파괴자인 상어 같은 존재일 땐 얘기가 달라진다. 성경은 그 상어의 정체를 밝혀 사탄이요 마귀라고 일컫는다. 그 놈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도 산티아고 노인처럼 외칠 것이다. 난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패배하진 않아!
이 작품에서 노인은 원래 혼자가 아니었다. 그를 돕는 마놀린(Manolin)이란 소년이 있었다. 노인이 오랫동안 고기를 못 잡자, 소년의 부모가 다른 배를 타게 하여 노인이 홀로 바다로 나간 것이었다.
그러나 소년은 산티아고를 여전히 존경하고 위했다. 노인의 고기잡이 도구 정리를 도와주고 먹을 것도 갖다준다.
노인은 홀로 출항한 이후에도 내내 소년을 아쉬워했다. 청새치를 상어에게 모두 뜯겨버린 채 돌아오게 되자 노인은 좌절감을 지울 수 없었다. 바다에서 돌아와 소년을 보자 허망한 마음이 밀려 올라왔다.
“난 놈들한테 졌단다, 마놀린.” 노인이 말했다. “놈들한테 정말 지고 말았어.” 노인을 걱정하던 소년은 고기와 싸우다 상처난 노인의 두 손을 보고 울음을 터뜨린다. 소년은 노인에게 다음엔 자기도 함께 고기잡이를 나가겠다고 말한다.
‘노인과 바다’의 소년은 성경 룻기의 룻을 떠올린다. 이민을 간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만 시어머니 나오미. 그때 며느리 룻은 절망의 늪에 빠진 나오미의 곁을 지키며 희망을 일궈낸다. 룻이 말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기1:16)”.
‘노인과 바다’에서도 소설의 종결 뒤 독자의 상상 속에서 함께 바다로 나설 산티아고 노인과 마놀린 소년은 성경의 나오미와 룻처럼 희망의 드림팀이다. 설령 그들이 또다시 상어를 만난다 해도 그때 둘은 필시 승리해낼 것이다.
드디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든다. 그리고 꿈을 꾼다. 작가 헤밍웨이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The old man was dreaming about the lions).
헤밍웨이가 선택한 마지막 단어, ‘사자’(the lions)는 포효하는 기상과 땅을 박차는 힘을 상징한다. 그 사자 꿈을 꾸는 한, 노인은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묻자. 난 어떤가. 남은 생을 살며 혹 뼈만 앙상한 물고기밖에 남지 않은 신세가 됐을 때, 나 역시 사자 꿈을 꿀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