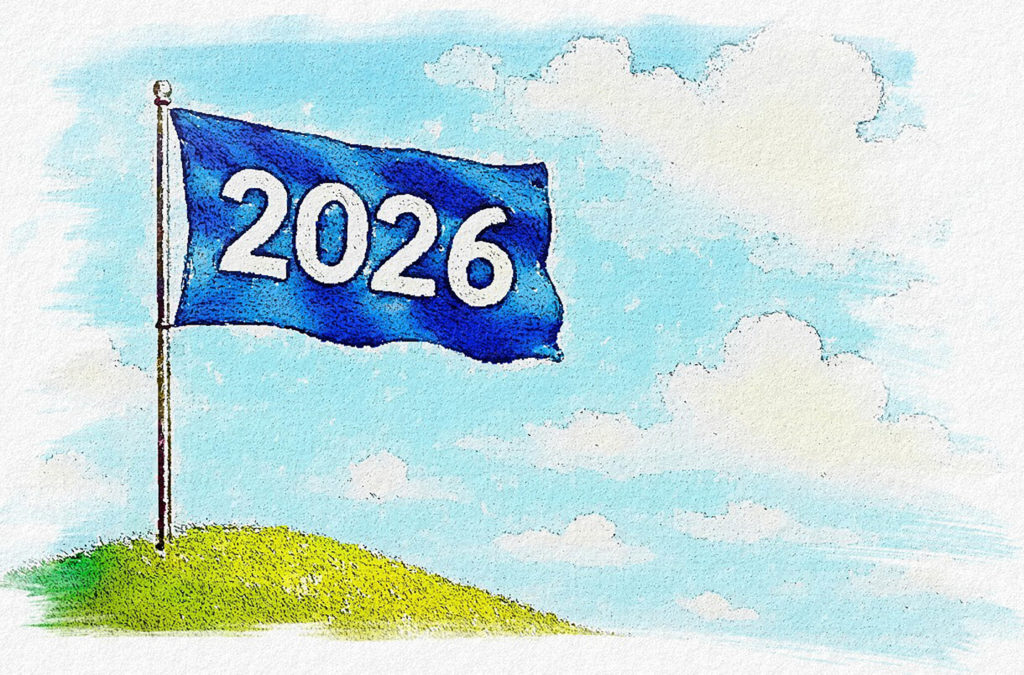새벽에 귓가를 울리는 소리
새해 첫날 새벽 어렴풋이 귓가에 들리는 아우성 소리에 잠을 깼다. 무슨 소린가 싶어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떠 방안을 살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지난해의 어둠이 채 물러가지 못했는지 창밖은 아직 어둡기만 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소리였지? 다시 잠을 청하려고 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안 오고 귓속에서 좀 전과 같은 소리가 또 울렸다.
“이상하군, 새해 벽두부터 무슨 환청(幻聽)인가?”하며 일어나 앉아 가만히 귀를 기울였더니, 그 소리는 아주 세미하지만 ‘소리없는 아우성, 소리없는 아우성’이라는 속삭임이 울리는 것처럼 들렸다. ‘소리없는 아우성’이라니 그건 청마(靑馬)의 시구절(詩句節) 아닌가? 왜 새해 아침 잠도 채 깨기 전에 이 구절이 귓속에 울리는 것일까 라고 의아해하면서도 나는 어느덧 마음속으로 그의 시 ‘깃발’을 되뇌고 있었다.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푯대 끝에
애수(哀愁)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소리없는 아우성
청마 유치환의 대표작의 하나인 이 시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을 만큼 유명하기에 한국인 모두에게 친숙한 시이다. 이 시가 쓰인 시대가 일제강점기였기에 ‘소리 없는 아우성’이란 은유로 묘사된 깃발은 아마도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표방하는 상징이었을 것이다. 말로 표현하고 소리쳐 사람들에게 알리고 더 큰 함성으로 일제(日帝)에 항거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었기에 ‘소리없는 아우성’인 깃발을 공중에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새해 새벽에 느닷없이 ‘소리없는 아우성’이란 소리가 환청처럼 내 귀를 울린 까닭은 아마도 며칠 전 친구 하나가 카톡으로 내게 보내 준 동영상과 글이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의 글에 의하면 동영상이 보여주듯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이 겨울에도 전국의 거리 곳곳에서 새로 들어선 정부의 잘못된 시책에 반대하는 크고 작은 민중 항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전혀 이를 보도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거리에서 외쳐대는 사람들의 주장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왜 이 추운 날씨에 거리로 뛰쳐나와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사실대로 보도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친구는 말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서 거리에 나와 목이 터져라 외쳐대지만 정부의 눈치만 보는 어용 언론들이 못 본 척 침묵하면 그들의 외침은 국민들의 귓가에 와 닿지 못하고 차가운 길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소리없는 아우성’으로 사라져 버리지 않느냐며 그 친구는 안타까워했다.
친구가 카톡으로 보내준 동영상을 보고 그의 글을 읽으며 나도 무척 안타까워 그날부터 티브이와 신문을 유심히 보았다. 그리고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KBS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에서도, 그리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신문에서도, 거리의 민중 항쟁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 티브이도 신문도 모두 정부 정책의 나팔수 노릇은 잘하고 있었지만 정책에 대한 일체의 비판이나 권고는 없었다.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간 뒤 민심은 흉흉하고 경제 상황은 악화해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지만 티브이도 신문도 스포츠와 연예계 소식은 대서특필하면서 크고 작은 도시들의 거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중항쟁에 대해서는 모두가 굳게 입을 닫고 있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거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리에서 외쳐지고 있는 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알맹이가 빠진 신문과 티브이를 보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마련이었다. 언론에서 다루어 주지 않는 민중의 함성은 ‘소리없는 아우성’이 되어 거리 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새해 새벽에 ‘소리없는 아우성’이란 아우성이 환청처럼 내 귀를 울린 이유를 나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깃발이라는 이름의 시(詩)
청마의 시 ‘깃발’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시이지만 깃발이 함축하고 있는 깊은 뜻을 음미하면 더욱 가슴이 뭉클해진다. 깃발이 하늘에 나부끼기 위해서는 깃대에 매여져야 한다. 그리고 깃대는 땅에 박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라도 하늘 혹은 공중이라는 이상에 도달해 나부끼고 싶지만 그러려면 깃대에 매여야 하고 깃대는 땅이라는 현실에 발을 딛고 서야 한다. 그러므로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깃대의 길이만큼 간극(間隙)이 있을 수밖에 없다. 깃발은 사회적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묘사하는 은유이자 상징이며 이러한 간극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청마가 살았던 일제강점기 사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사회에 다 같이 존재한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완전한 현실은 없기에 사람들은 깃발을 올린다. 청마의 시대는 일제 강점기였기에 소리 내어 말로 표현할 수 없었기에 깃발을 올려도 소리없는 아우성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 자유민주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깃발은 더 이상 소리없는 아우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시든 시골이든 우리 사회 어디에서든 공중에 깃발이 오르면 신문도 티브이도 즉각 그 깃발이 무엇 때문에 공중에 올려졌는지, 무슨 말을 하고 전하고 싶어 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사회에서 언론이 할 일이고 그래야 두 다리로 현실이라는 땅을 딛고 깃대에 이상(理想)이라는 깃발을 매어 올린 민중의 함성이 ‘소리없는’ 아우성으로 길거리에 떨어져 버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세미(細微)한 목소리
청마가 1936년에 시 ‘깃발’을 ‘조선문단’에 발표한 지 정확히 90년이 지나 2026년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그야말로 극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제의 강점기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가 되었고 비극적인 동족상잔(同族相殘)의 6.25를 겪었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다.
그러나 반세기 남짓한 짧은 세월에 이룩된 경제발전 뒤안길의 보이지 않는 사회 구석구석에서는 많은 부조리가 있고 아직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잘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오늘도 추운 겨울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함성을 지른다.
2026년에는 그들이 지르는 함성이 ‘소리없는 아우성’이 되지 않고 모두에게 잘 알려져 나라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거리에서 지르는 함성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듣지 못하고 결국은 세미(細微)한 목소리가 되어 허공중에 떠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이나 지진과 불에도 계시지 않다가 세미한 목소리로 나타나셨다(열왕기상 19:12)’고 했다. 거리에서 부르짖는 민중의 함성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소리없는 아우성’이 되기 전에 세미한 목소리로 변하면 그 목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경고가 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2026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